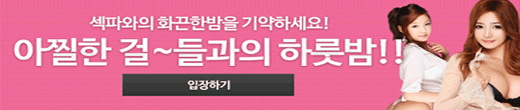섬사람들....(둘)
나는 그런 벌교댁을 뭐라하지 못하고 애써 술을 축였다.
김씨가 불현 듯 내게 물었다. "학상은 몇번이나 해봤어?"
나는 놀라 "네?!"하고 대답하자. 김씨와 서씨는 껄걸 웃고만 있었다.
벌교댁은 그런 날 보더니 허벅지 안쪽을 강하게 잡았다.
나는 그것이 싫지는 않았지만 김씨와 서씨가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자리를 피하고자 일어섰다.
"어디가능겨?"
"네, 화장실 좀"
내가 대답하자 김씨가 농을 걸었다.
"젊은께 벌써 꼴려나 보지?. 손으로 할라고?"
"네?, 아니요."
대답에 그들이 웃는 소리를 뒤로하고 뒷문으로 나왔다.
섬에는 밤이 깊었고, 바다 멀리서 간간히 밤 작업을 하는 배들의 불빛들이 별빛들처럼 아롱지고 있었다.
샛바람이 불고 있었다. 비가 올 듯 했다. 바다에서 샛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는 징조란 것을 이곳에 와서 난 알았다.
낼 작업은 없을 듯 하다, 그래서 그들은 벌써 알고 저렇게 밤 늦게까지 술추렴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화장실에서 김씨의 이야기에 살포시 부풀었던 물건을 꺼내어 시원하게 방료를 하고 있는데
바람소리와 함께 물 붓는 소리가 들렸다. 난 그 소리에 화장실 위쪽에 환기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담 너머로 누군가가 수돗가에서 씻는 소리였다.
"이 밤중에 ---"
난 그저 무심하게 생각하고 다시 방뇨를 마친 물걸을 몇차례 털고 옷을 입는데 담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끝났어?. 얼른 와, 나 시방 급혀"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알았당께요. 금방 가요. 급허기는."
남자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목소리는 세상 때를 조금 묻힌듯한 세월이 담겨진 여자의 목소리였다.
난 부랴부랴 화장실을 나와 담벽에 기대섰다. 내 키는 담보다 크지만 들킬까봐 허리를 잔뜩 숙이고 있었다.
그리곤 살며시 고개를 들어 담 너머를 보니 여인네 하나가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달빛도 없는 밤이라서 그런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네의 옴팡진 엉덩이는 보름달 보다 빛 났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아는지 그 여인네는 결코 나에게 등만을 허락했다.
나의 물건은 여인네의 엉덩이를 보고도 서서히 힘을 주고 있었다.
여인네는 수건으로 몸을 닦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옷을 입지도 않은채 챙겨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렇게 멍하게 닭쫓던 개 지붕처다 보듯 보고 있다가
여인네가 들어간 방에서 들려오는 말 소리에 귀를 기우렸다.
"순심이 잘랑가 몰라?"
"아 그년, 밥 술갈 떨어지면 자잖여. 염려말어. 워따. 몸이 차갑네. 어서 들어 오소" 남자가 여인네를 불렀다.
"아따, 쪼끔만 기둘려 봇쑈"
"아 이걸 보고도 그랴?"
"옴메, 뭐헌디 벌써 그리 커져 부렀소?"
"아, 개불이 해삼 묵는다고 생각헝께 안 그리 되부러었다고."
"앗따, 오늘 개불 다 뽈아 묵어야 쓰것구먼이라. 내 해삼도 팅팅불었는디. 내 물도 잠 빼줏쇼. 알았지라"
여인네의 말을 마치고 그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섬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함께 가끔씩 까르륵 거리는 웃음 소리가 바람에 섞였을 뿐이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 개불은 갯벌에 나는 연체동물로서 물을 몸안으로 빨라들여 커지는 족속이다. 그 생김새가 꼭 성기와 닮아서 바닷가에선 남자를 개불로 표현한다. 또한 해삼은 같은 연체동물로 속이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자를 해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개불은 정력제로 알려져있다)
밤 하늘을 마냥 바라보다 난 발걸음을 되돌려 돌아 오려 하는데 어디선가 "삐그덕" 거리면 조심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담 너머로 시선을 월담 시켰다.
작은 방에서 어떤 계집이 나오곤 여인네가 들어갔던 방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 계집아이는 여인네가 말한 "순심"이었다.
생김새는 까맣고 작달만해 중학생이나 되엇을까 싶지만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다는 아이였다.
순심이는 조심히 깨끔발을 하고 방 가까이 오더니 방문 아래에서 귀를 기우리며 까르륵 거리면 숨너머가는
자기 부모들의 교성을 듣고 있었다. 난 그런 순심이를 보고자 고개를 쭉 내밀었더니 발 밑에서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뚝" 불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얼른 숨기고, 누군가가 조심스럽지만 황급히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난 자리를 피해 술집으로 다시 들어 왔다.
"아, 뭐하고 인제 오능겨?. 진짜로 물 한번 빼고 왔어?" 김씨가 물었다.
"------"
내가 아무말이 없자 서씨가 벌교댁을 힐끔 보고는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굶어 죽게 생긴 벌교댁한테나 줘버려. 히히히"하고 말을 걸었다.
벌교댁은 그 농에 질쌔라, "아 서런 시풀뎅뎅한 풋자지는 줘도 안묵어. 떫기만 하제, 뭔 맛이 있간디"하고 받았다.
난 쭈볏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어쩌면 이들과 몇일이라도 있으려면 그런 농짓거리에 익숙해져야 함을 배워야 했고,
그것은 또 한 세상의 교과서 밖의 배움이었다.
김씨가 말을 이었다. 그 사이 현철이 엄마는 벌써 옷을 다 벗었고, 젖가슴의 거미줄이 다 거둬지고 이제 막힌 동굴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었다.
"아, 그년 가슴이 고로코롬 맛날지는 몰랐당께, 애를 둘이나 까고도 탱탱한 것이 꼭 처녀 갓드만. 그려서
내가 입으로 쪽쪽 뽕께. 이년이 "옴마야, 옴마야" 하면서 허리를 요리조리 비틀드랑께. 난 처음엔 좋아서 그런줄 알았는디
아 이년이 지 씹은 내 좆에 대고 이리지리 비비는 것 아니것어.
하~, 요것도 애난 지집이라고 맛은 알구나 생각허고는 손으로 씹두덩을 만진디. 씹털이 보드라운 것이
뻣뻣한 우리 냄비하곤 또 다른 맛이더랑께. 손으로 씹두덩을 살포시 문덴디. 이년이 내 주뎅이에다
샛바닥(혀)를 집어 넣드랑께. 아 그래서 난 실컷 뽈아 ?지. 이년 그랑께 몸을 파르르 떨면서 내게 꼭 안깅디 정말 죽겄데.
내가 그년 샛바닥 뽈면서 손을 아래로 살 가져갔지. 그란디 내가 깜짝 놀랐잖여. 뭣 때문이냐고?
아 글씨 이년 등대가 완전히 거문대 등대여?. 아따. 서씨야 그말 모르겄냐. 염병할놈.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묵어야제,
그년 공알(크리토리스)이 엄청 크드란 말이시. 콩알보다 크고 거, 거짓말 쫌 보태서 대추씨만 허드랑께
내가 놀라서 그년 빨던 샛바닥 버려불고 얼른 밑으로 내려와서 봉께 공알이 씹덮개(소음순)를 밀치고 올라와 있는디
저 앞산에 바위맹키로 툭 솟아드랑께, 내가 보고 있응께 숙쓰러운가. 뭐라고 한디 내가 그말이 들릴 것이여
내가 입으로 그 공알을 쪽 뽈았드니만 그년 허리를 뒤로 발랑당 까지면서 소리를 지르는디 내가 뒤를 살펴볼 정도로 소리가 크드랑께
내가 그년 담에도 나한테 주게 할라면 봉사를 잘해야 할 것 아니여.
그래서 공알도 쪽쪽 빨아주고 씹덮개도 잘근씹어주었제.
근디 그맛 안가? 보지를 바닷물에 한번 빨아서 그런지. 짭조름 한것이 일뿜이더만.
서씨 너도 한번 니 마누라 보지 소금 물로 씻겨서 뽈아봐라. 뒤진다. 무쟈게 만나.
내가 내 쌔(혀)로 그년 씹을 요리조리 돌링께, 아, 막혔단 씹구멍에서 맑간 샘물이 폴폴 나오드란 말이시
아 그것이 보약이 아니고 뭐시것어. 그래서 내가 다 뽈아 묵어 부렀지. 아 그니까. 이놈의 샘이 더 발광을 함시로
더 많이 쏟아 내등만. 허허.
짭잘한 보약 그날 많이 묵어부렀다. 허허
그년 몸이 달아오르는지 몸이 뜨끈뜨끈 하등마.
아, 그래서 나도 못참게다 싶어서 올라탔지. 근디 이년이 얼마나 급했능가
내 좆을 잡고 지 씹구멍에 넣더라고
좆이 미끈 거리면서 쑤욱 들어가는디 씹구멍 입구에서 한번 막힌듯 싶등만 깊이도 들어간디
그 속이 얼마나 뜨겁던지. 내 좆 익어분줄 알았네.
아, 그란디 이년 몸을 뒤로 까면서 지렁이 몸 꽈땟끼 까는디 내가 힘이 부치더란 말이시
내가 질 놈인가. 나도 다시 좆 뒤로 뺏다가 다시 집어 넣는디
한번씩 그럴때 마다. "엄니~, 엄니~"하는디
내가 지 엄씨도 아니고, 왜 자꼬 엄니 하는지 모르것드랑께. 지야 좋아서 그랬겄지만.
내가 안되겄다 싶어서 좆질을 빨리 해부렀지. 그랑께 이년이 인자 엄니 소리다 다 못하고
"엄. 엄. 엉. 엉. 어, 어. 어 ." 그라데. 허허
그렇게 내가 신나게 하는디 이년이 숨 몰아심서 곧 뒤질 것같이 그러드만
눈을 번뜩 뜨드만 눈깔이 초점이 없어갔고. 헉헉 거리등만
다시 눈 찔끔 감고 날 꼭 껴안은디 씹에서 뜨끈한 것이 왕창 쏟아져불등만.
올채, 니가 인자 갔구나 싶어서 더 움질일란디. 이년이 날 꼭 안고 다리론 내 엉덩이를 감고는 안풀어주는 것 아니여.
꼭 비얌(뱀) 한마리가 날 칭칭 감고 있는 것 같드만.
근디 비얌이었으면 징그러웠을 것인디.
고년 씹이 내 좆을 잘근잘근 씹어주는디 참 말로 이빨 없는 망구가 내 좆 뽄것 맹키로 아플만큼 기분좋게 물어주드랑께.
그렇게 한참을 있다 이년이 눈을 살포시 뜸시롱 날 보고 방긋이 웃네. 허허
이년아. 그리 좋냐. 물으니까. 고개만 까딱 거림시롱 내 볼에 뽀뽀를 찐하게 허드랑게.
아 긍께 내가 그렸지. "아직 안끝났다. 이년아."
그리곤 좆을 사정없이 씹구멍으로 몰아 쳐불었지. 긍께 "어어어엄~~~~니!!"하면서 또 발광을 하드랑께
내가 2차전 들어갔응께 인자는 내 지집이구나 생각하고 사정없이 몰아 쳐불었지.
그년 씹이 내 좆 물고 안나줄랑께 난 더 힘쓰고 그럴 때마다. 그년 씹은 더 꽉물고
나도 얼마나 기분 좋던지.
"아. 이 씨불년아 좋냐? 좋아?." 하면서 더 씨게 박아 줬지.
이년 또 그랑께 눈 뜸시롱 내 몸 꽉 안은디. 그년 손톱이 내등에 꽉 박히드란 말이시.
손톱에 상처가 나는것 같은디 왜 그리 난 기분이 좋았능가 몰라.
그년 또 뜨거운 씹물 쏟으면서 내 좆 물자 나도 안되것다. 싶어서 그년 말리는 데도.
사정없이 박아 부렀지. 오메 오메.
내 좆 끝이 사정없이 커져붐서 펑하고 좆물 싸는디, 아 싸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미치것는디
아 좆을 잘근잘근 씹는디. 눈에 별이 다 뜨드랑께."
바람이 더 거세져 술집 유리창을 치고 있었다.
서씨는 입맛을 다시며 김씨의 입을 보고 있었고, 김씨는 그런 서씨를 보고 자랑스럽다는 듯
허허. 헛웃음 지어 보이며 술을 들이켰다.
벌교댁은 술상에 팔개고 누워서 술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허벅지를 잡았던 손은 언제 풀렸는지 벌교댁의 사타구니 사이로 가 있었다.
나의 물건에서는 꼴리다 못해 물을 조금씩 뱉어내고 있었다.
"참말로 좋았겄다 잉" 서씨가 김씨에게 물었다.
"말이라고" 김씨가 답을 하곤 창밖을 보았다.
"학상 낼 비올팅께, 낼은 쉬드라고. 서씨야, 가자!"
그 소리에 벌교댁이 몸 일으켜 술상을 치우기 시작하고
"그 뒤로 몇번 묵었냐?" 서씨가 엉거주춤 일어나며 김씨에게 물었다.
김씨는 술집 미닫이 창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년 가지 전까지 한 니번 묵었다." 말했다.
"아, 씨불놈아. 그럼 그때 나한테도 말해주지 그랬냐?" 서씨가 따라 나가며 말했다.
"씨발놈, 글믄 니허고 나하고 구멍동서 하라고야?" 김씨가 대답했다.
"야, 이놈아 니랑 내랑 해삼 구멍 동기 아니라고?" 서씨가 웃으며 말했다.
"맞다, 맞어. 담에 그런 기회 있음 말해주마" 하고 김씨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벌교댁이 얼추 술상을 치우자
"학생, 술 한잔 더 할라우?" 하고 물었다.
난 건성으로 "네"하고 답하자
벌교댁은 남은 횟감과 막걸리 두병을 빼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난 생각했다. 현철엄마가 지금도 있었으면 나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담너머 여인네는 어이 되었는지.
순심이는 또..
벌교댁은 왜 내 허벅지를 잡았던 것일까?. 생각이 있는 것일까. 벌교댁이 얼마나 나이가 먹었을까?
내가 나이 가릴 처지일까.
그렇게 막걸리 두병이 빈병으로 사라지고
바람은 또 밤을 잊은채 골목을 강간하고 있었다.
난 또 온통 머리 속에 여인네들의 질펀함을 생각하고 해삼을 생각하고 개불을 생각하며 스르르 잠들어 가고 있었다.
그때쯤.
"아이고, 아이고, 숨이여."하고 소리가 들렸다.
"밖에 누구 없어" 벌교댁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날 불렀다.
난 얼핏 취한 잠에서 일어나 벌교댁 방문을 열었다.
벌교댁은 속옷만 입은채로 이불 위에 엎드려 가슴을 치고 있었다.
하얀 속 고쟁이가 눈에 들어왔다. 헐렁해진 런닝 사이로 젖 가슴살이 보였다.
"왜, 그러요?"
"응, 학생 물 좀 떠다줘. 채했나벼"
_계속-
20030604
- 급하게 치다보니 오타가 많아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서 설명을 부연할 부분은 하겠지만. 그럼 맛이 떨어질 것 같아서, 혹여나 모르는 낱말들이 나오시면 문의를 주십시오.
[email protected] (비평 및 낱말 문의처)
나는 그런 벌교댁을 뭐라하지 못하고 애써 술을 축였다.
김씨가 불현 듯 내게 물었다. "학상은 몇번이나 해봤어?"
나는 놀라 "네?!"하고 대답하자. 김씨와 서씨는 껄걸 웃고만 있었다.
벌교댁은 그런 날 보더니 허벅지 안쪽을 강하게 잡았다.
나는 그것이 싫지는 않았지만 김씨와 서씨가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자리를 피하고자 일어섰다.
"어디가능겨?"
"네, 화장실 좀"
내가 대답하자 김씨가 농을 걸었다.
"젊은께 벌써 꼴려나 보지?. 손으로 할라고?"
"네?, 아니요."
대답에 그들이 웃는 소리를 뒤로하고 뒷문으로 나왔다.
섬에는 밤이 깊었고, 바다 멀리서 간간히 밤 작업을 하는 배들의 불빛들이 별빛들처럼 아롱지고 있었다.
샛바람이 불고 있었다. 비가 올 듯 했다. 바다에서 샛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는 징조란 것을 이곳에 와서 난 알았다.
낼 작업은 없을 듯 하다, 그래서 그들은 벌써 알고 저렇게 밤 늦게까지 술추렴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화장실에서 김씨의 이야기에 살포시 부풀었던 물건을 꺼내어 시원하게 방료를 하고 있는데
바람소리와 함께 물 붓는 소리가 들렸다. 난 그 소리에 화장실 위쪽에 환기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담 너머로 누군가가 수돗가에서 씻는 소리였다.
"이 밤중에 ---"
난 그저 무심하게 생각하고 다시 방뇨를 마친 물걸을 몇차례 털고 옷을 입는데 담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끝났어?. 얼른 와, 나 시방 급혀"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알았당께요. 금방 가요. 급허기는."
남자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목소리는 세상 때를 조금 묻힌듯한 세월이 담겨진 여자의 목소리였다.
난 부랴부랴 화장실을 나와 담벽에 기대섰다. 내 키는 담보다 크지만 들킬까봐 허리를 잔뜩 숙이고 있었다.
그리곤 살며시 고개를 들어 담 너머를 보니 여인네 하나가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달빛도 없는 밤이라서 그런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네의 옴팡진 엉덩이는 보름달 보다 빛 났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아는지 그 여인네는 결코 나에게 등만을 허락했다.
나의 물건은 여인네의 엉덩이를 보고도 서서히 힘을 주고 있었다.
여인네는 수건으로 몸을 닦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옷을 입지도 않은채 챙겨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렇게 멍하게 닭쫓던 개 지붕처다 보듯 보고 있다가
여인네가 들어간 방에서 들려오는 말 소리에 귀를 기우렸다.
"순심이 잘랑가 몰라?"
"아 그년, 밥 술갈 떨어지면 자잖여. 염려말어. 워따. 몸이 차갑네. 어서 들어 오소" 남자가 여인네를 불렀다.
"아따, 쪼끔만 기둘려 봇쑈"
"아 이걸 보고도 그랴?"
"옴메, 뭐헌디 벌써 그리 커져 부렀소?"
"아, 개불이 해삼 묵는다고 생각헝께 안 그리 되부러었다고."
"앗따, 오늘 개불 다 뽈아 묵어야 쓰것구먼이라. 내 해삼도 팅팅불었는디. 내 물도 잠 빼줏쇼. 알았지라"
여인네의 말을 마치고 그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섬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함께 가끔씩 까르륵 거리는 웃음 소리가 바람에 섞였을 뿐이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 개불은 갯벌에 나는 연체동물로서 물을 몸안으로 빨라들여 커지는 족속이다. 그 생김새가 꼭 성기와 닮아서 바닷가에선 남자를 개불로 표현한다. 또한 해삼은 같은 연체동물로 속이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자를 해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개불은 정력제로 알려져있다)
밤 하늘을 마냥 바라보다 난 발걸음을 되돌려 돌아 오려 하는데 어디선가 "삐그덕" 거리면 조심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담 너머로 시선을 월담 시켰다.
작은 방에서 어떤 계집이 나오곤 여인네가 들어갔던 방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 계집아이는 여인네가 말한 "순심"이었다.
생김새는 까맣고 작달만해 중학생이나 되엇을까 싶지만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다는 아이였다.
순심이는 조심히 깨끔발을 하고 방 가까이 오더니 방문 아래에서 귀를 기우리며 까르륵 거리면 숨너머가는
자기 부모들의 교성을 듣고 있었다. 난 그런 순심이를 보고자 고개를 쭉 내밀었더니 발 밑에서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뚝" 불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얼른 숨기고, 누군가가 조심스럽지만 황급히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난 자리를 피해 술집으로 다시 들어 왔다.
"아, 뭐하고 인제 오능겨?. 진짜로 물 한번 빼고 왔어?" 김씨가 물었다.
"------"
내가 아무말이 없자 서씨가 벌교댁을 힐끔 보고는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굶어 죽게 생긴 벌교댁한테나 줘버려. 히히히"하고 말을 걸었다.
벌교댁은 그 농에 질쌔라, "아 서런 시풀뎅뎅한 풋자지는 줘도 안묵어. 떫기만 하제, 뭔 맛이 있간디"하고 받았다.
난 쭈볏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어쩌면 이들과 몇일이라도 있으려면 그런 농짓거리에 익숙해져야 함을 배워야 했고,
그것은 또 한 세상의 교과서 밖의 배움이었다.
김씨가 말을 이었다. 그 사이 현철이 엄마는 벌써 옷을 다 벗었고, 젖가슴의 거미줄이 다 거둬지고 이제 막힌 동굴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었다.
"아, 그년 가슴이 고로코롬 맛날지는 몰랐당께, 애를 둘이나 까고도 탱탱한 것이 꼭 처녀 갓드만. 그려서
내가 입으로 쪽쪽 뽕께. 이년이 "옴마야, 옴마야" 하면서 허리를 요리조리 비틀드랑께. 난 처음엔 좋아서 그런줄 알았는디
아 이년이 지 씹은 내 좆에 대고 이리지리 비비는 것 아니것어.
하~, 요것도 애난 지집이라고 맛은 알구나 생각허고는 손으로 씹두덩을 만진디. 씹털이 보드라운 것이
뻣뻣한 우리 냄비하곤 또 다른 맛이더랑께. 손으로 씹두덩을 살포시 문덴디. 이년이 내 주뎅이에다
샛바닥(혀)를 집어 넣드랑께. 아 그래서 난 실컷 뽈아 ?지. 이년 그랑께 몸을 파르르 떨면서 내게 꼭 안깅디 정말 죽겄데.
내가 그년 샛바닥 뽈면서 손을 아래로 살 가져갔지. 그란디 내가 깜짝 놀랐잖여. 뭣 때문이냐고?
아 글씨 이년 등대가 완전히 거문대 등대여?. 아따. 서씨야 그말 모르겄냐. 염병할놈.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묵어야제,
그년 공알(크리토리스)이 엄청 크드란 말이시. 콩알보다 크고 거, 거짓말 쫌 보태서 대추씨만 허드랑께
내가 놀라서 그년 빨던 샛바닥 버려불고 얼른 밑으로 내려와서 봉께 공알이 씹덮개(소음순)를 밀치고 올라와 있는디
저 앞산에 바위맹키로 툭 솟아드랑께, 내가 보고 있응께 숙쓰러운가. 뭐라고 한디 내가 그말이 들릴 것이여
내가 입으로 그 공알을 쪽 뽈았드니만 그년 허리를 뒤로 발랑당 까지면서 소리를 지르는디 내가 뒤를 살펴볼 정도로 소리가 크드랑께
내가 그년 담에도 나한테 주게 할라면 봉사를 잘해야 할 것 아니여.
그래서 공알도 쪽쪽 빨아주고 씹덮개도 잘근씹어주었제.
근디 그맛 안가? 보지를 바닷물에 한번 빨아서 그런지. 짭조름 한것이 일뿜이더만.
서씨 너도 한번 니 마누라 보지 소금 물로 씻겨서 뽈아봐라. 뒤진다. 무쟈게 만나.
내가 내 쌔(혀)로 그년 씹을 요리조리 돌링께, 아, 막혔단 씹구멍에서 맑간 샘물이 폴폴 나오드란 말이시
아 그것이 보약이 아니고 뭐시것어. 그래서 내가 다 뽈아 묵어 부렀지. 아 그니까. 이놈의 샘이 더 발광을 함시로
더 많이 쏟아 내등만. 허허.
짭잘한 보약 그날 많이 묵어부렀다. 허허
그년 몸이 달아오르는지 몸이 뜨끈뜨끈 하등마.
아, 그래서 나도 못참게다 싶어서 올라탔지. 근디 이년이 얼마나 급했능가
내 좆을 잡고 지 씹구멍에 넣더라고
좆이 미끈 거리면서 쑤욱 들어가는디 씹구멍 입구에서 한번 막힌듯 싶등만 깊이도 들어간디
그 속이 얼마나 뜨겁던지. 내 좆 익어분줄 알았네.
아, 그란디 이년 몸을 뒤로 까면서 지렁이 몸 꽈땟끼 까는디 내가 힘이 부치더란 말이시
내가 질 놈인가. 나도 다시 좆 뒤로 뺏다가 다시 집어 넣는디
한번씩 그럴때 마다. "엄니~, 엄니~"하는디
내가 지 엄씨도 아니고, 왜 자꼬 엄니 하는지 모르것드랑께. 지야 좋아서 그랬겄지만.
내가 안되겄다 싶어서 좆질을 빨리 해부렀지. 그랑께 이년이 인자 엄니 소리다 다 못하고
"엄. 엄. 엉. 엉. 어, 어. 어 ." 그라데. 허허
그렇게 내가 신나게 하는디 이년이 숨 몰아심서 곧 뒤질 것같이 그러드만
눈을 번뜩 뜨드만 눈깔이 초점이 없어갔고. 헉헉 거리등만
다시 눈 찔끔 감고 날 꼭 껴안은디 씹에서 뜨끈한 것이 왕창 쏟아져불등만.
올채, 니가 인자 갔구나 싶어서 더 움질일란디. 이년이 날 꼭 안고 다리론 내 엉덩이를 감고는 안풀어주는 것 아니여.
꼭 비얌(뱀) 한마리가 날 칭칭 감고 있는 것 같드만.
근디 비얌이었으면 징그러웠을 것인디.
고년 씹이 내 좆을 잘근잘근 씹어주는디 참 말로 이빨 없는 망구가 내 좆 뽄것 맹키로 아플만큼 기분좋게 물어주드랑께.
그렇게 한참을 있다 이년이 눈을 살포시 뜸시롱 날 보고 방긋이 웃네. 허허
이년아. 그리 좋냐. 물으니까. 고개만 까딱 거림시롱 내 볼에 뽀뽀를 찐하게 허드랑게.
아 긍께 내가 그렸지. "아직 안끝났다. 이년아."
그리곤 좆을 사정없이 씹구멍으로 몰아 쳐불었지. 긍께 "어어어엄~~~~니!!"하면서 또 발광을 하드랑께
내가 2차전 들어갔응께 인자는 내 지집이구나 생각하고 사정없이 몰아 쳐불었지.
그년 씹이 내 좆 물고 안나줄랑께 난 더 힘쓰고 그럴 때마다. 그년 씹은 더 꽉물고
나도 얼마나 기분 좋던지.
"아. 이 씨불년아 좋냐? 좋아?." 하면서 더 씨게 박아 줬지.
이년 또 그랑께 눈 뜸시롱 내 몸 꽉 안은디. 그년 손톱이 내등에 꽉 박히드란 말이시.
손톱에 상처가 나는것 같은디 왜 그리 난 기분이 좋았능가 몰라.
그년 또 뜨거운 씹물 쏟으면서 내 좆 물자 나도 안되것다. 싶어서 그년 말리는 데도.
사정없이 박아 부렀지. 오메 오메.
내 좆 끝이 사정없이 커져붐서 펑하고 좆물 싸는디, 아 싸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미치것는디
아 좆을 잘근잘근 씹는디. 눈에 별이 다 뜨드랑께."
바람이 더 거세져 술집 유리창을 치고 있었다.
서씨는 입맛을 다시며 김씨의 입을 보고 있었고, 김씨는 그런 서씨를 보고 자랑스럽다는 듯
허허. 헛웃음 지어 보이며 술을 들이켰다.
벌교댁은 술상에 팔개고 누워서 술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허벅지를 잡았던 손은 언제 풀렸는지 벌교댁의 사타구니 사이로 가 있었다.
나의 물건에서는 꼴리다 못해 물을 조금씩 뱉어내고 있었다.
"참말로 좋았겄다 잉" 서씨가 김씨에게 물었다.
"말이라고" 김씨가 답을 하곤 창밖을 보았다.
"학상 낼 비올팅께, 낼은 쉬드라고. 서씨야, 가자!"
그 소리에 벌교댁이 몸 일으켜 술상을 치우기 시작하고
"그 뒤로 몇번 묵었냐?" 서씨가 엉거주춤 일어나며 김씨에게 물었다.
김씨는 술집 미닫이 창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년 가지 전까지 한 니번 묵었다." 말했다.
"아, 씨불놈아. 그럼 그때 나한테도 말해주지 그랬냐?" 서씨가 따라 나가며 말했다.
"씨발놈, 글믄 니허고 나하고 구멍동서 하라고야?" 김씨가 대답했다.
"야, 이놈아 니랑 내랑 해삼 구멍 동기 아니라고?" 서씨가 웃으며 말했다.
"맞다, 맞어. 담에 그런 기회 있음 말해주마" 하고 김씨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벌교댁이 얼추 술상을 치우자
"학생, 술 한잔 더 할라우?" 하고 물었다.
난 건성으로 "네"하고 답하자
벌교댁은 남은 횟감과 막걸리 두병을 빼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난 생각했다. 현철엄마가 지금도 있었으면 나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담너머 여인네는 어이 되었는지.
순심이는 또..
벌교댁은 왜 내 허벅지를 잡았던 것일까?. 생각이 있는 것일까. 벌교댁이 얼마나 나이가 먹었을까?
내가 나이 가릴 처지일까.
그렇게 막걸리 두병이 빈병으로 사라지고
바람은 또 밤을 잊은채 골목을 강간하고 있었다.
난 또 온통 머리 속에 여인네들의 질펀함을 생각하고 해삼을 생각하고 개불을 생각하며 스르르 잠들어 가고 있었다.
그때쯤.
"아이고, 아이고, 숨이여."하고 소리가 들렸다.
"밖에 누구 없어" 벌교댁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날 불렀다.
난 얼핏 취한 잠에서 일어나 벌교댁 방문을 열었다.
벌교댁은 속옷만 입은채로 이불 위에 엎드려 가슴을 치고 있었다.
하얀 속 고쟁이가 눈에 들어왔다. 헐렁해진 런닝 사이로 젖 가슴살이 보였다.
"왜, 그러요?"
"응, 학생 물 좀 떠다줘. 채했나벼"
_계속-
20030604
- 급하게 치다보니 오타가 많아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서 설명을 부연할 부분은 하겠지만. 그럼 맛이 떨어질 것 같아서, 혹여나 모르는 낱말들이 나오시면 문의를 주십시오.
[email protected] (비평 및 낱말 문의처)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9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9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