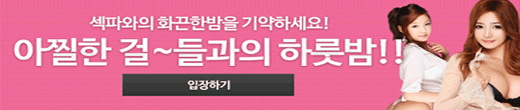제 2권
제6장
"대련님. 대련님."
저녁밥을 먹기가 바쁘게 방에 들어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엇던 봉남이는 삼례가 자신을 부르며 가만이
흔드는 손길에 눈을 뜬다.
"대련님 후라시(손전등)있제?."
"쩌그...."
봉남이는 한참 달게 잠을 자는데 그렇게 삼례가 깨워서 묻자 잠뜻을 하듯이 그렇게 옹알거려가며 앉은
뱅이 책상을 가리키고는 그러는 삼례가 귀챦다는 듯이 몸을 돌려 눕고는 다시 잠속으로 빠저든다. 삼례
는 봉남이가 가르킨 앉은뱅이 책상 설합을 열어 손전등을 ?아들고 자신이 들어왔던 방에서 정재로 통하
는 작은 샛문을 통해 정재로 나간다.
그랬던 삼례는 정재에 걸려 있던 등불을 내려 손에 들고는 이례와 같이 정재를 나와 문래에 앉아서 담
배를 피우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시키고는 이례를 바래다 주고 오겠다고 하고서는 이례와 같
이 집을 나간다.
요새 몇일째 봉남이네 집 보리베기 일이 계속 되고 있엇는데 오늘 이례가 와서 일을 했다. 이례는 같은
동네가 아니였기에 일을 마치자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삼례가 한사코 붙잡는 바람에 봉남이 집으로 왔던
것이다.
그랬던 이례는 높(일꾼)들이 저녁밥을 먹고서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아서 삼례가 하는 설것이 일
을 도와 주고 서 느즈막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삼례가 그런 이례에게 손전등을 가지고 가게 하려고
봉남이를 깨워서 손전등을 가저 갔던 것이다.
그렇게 삼례가 이례를 바래다 준다고 나간지 얼마쯤 지났을 때, 봉남이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서는 이불
도 덮지方?맨 방바닥에서 곤히 자고 있는 봉남이에게 이불을 덮어 줘가며 "잘라먼 이불 피고 좋게 팬하
게 자든가 글제. 요고시 요새 일 쪼깐 하드마는 된(피곤)가 보네. 아이고 내 새끼. 요새 욕(고생)본다. 욕
봐." 그러면서 봉남이를 다둑거려간다.
봉남이 엄마로써는 요즘 같이 일손이 딸린 마당에 봉남이가 벌써 한몫을 톡톡히 해내니 참으로 오졌던
것이다. 품앗시 온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으면서 봉남이가 일잘한다고 하면서 품 값을 때 순호 대신 봉남
이를 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몰론 그것이 우스개 소리였지만 봉남이는 진짜 열심히 했다. 보리논 한 두렁씩 차고서 보리를 베기 시
작하면은 제일 먼저 다 베고서는 묶어놓은 보리 다발을 길옆으로 옴겨 놨다. 일꾼들이 그런 봉남이를 보
고 잘한다.잘한다 치켜세워주니까 봉남이는 더 신이나서 더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봉남이처
럼 벼락치기로 일을 하다보며 몸이 쉬이 지치는 법이고, 저녁 무렵에는 갑짜기 허기(虛飢)가 지면서 기운
이 쭉-!. 빠졌던 것이다.
봉남이는 엄마의 그런 소리와 자신을 건드리는 손길에 잠자다 말고 일어나더니 정재로 통하는 샛문을
열고 나간다.
"자다 말고 정재는 왜가냐이?."
"물 묵을라고."
"나한테 떠다 달라 글제."
봉남이는 허기(虛飢)지고 배가 고팟기에 저녁밥을 좀 짜게 먹엇는지 물이 쓰인 것이다. 물 한 대접을 단
숨에 마서가는 봉남이는 물이 꿀맛같이 달다고 느낀다..
"행수 성은 갔어?."
물을 한 대접 먹고 대접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들어오면서 봉남이가 묻는다.
"응. 아까 전에 갔다."
봉남이는 그런 엄마 말을 들으며 이불속에 몸을 눕혀간다. 그러면서 이례를 생각한다. 이례는 얼마 전
에 봉남이와 그일이 있고나서 봉남이와 다시 만났지만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외면을 했
다.
이례로써는 이유야 어찌 되엇던 간에 봉남이에게 자신의 첫 순결을 바친터라 봉남이와 눈을 마주치기
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례는 자신에게 향해지는 봉남이의 시선을 자주 느꼈다.
봉남이는 그일(들킬뻔한일)이 있고나서부터 삼례와 씹질도 한동안 않한 탓인지 자신과 살섞음을 한번
했던 이례에게 관심이 갔던 것이다. 봉남이가 이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인 것은, 배불리 먹을것이 있을
때는 맛없는 것을 내버려두고 잊고 있다가 배고플 때 아쉬워서 그걸 다시 ?는 마음이엇다.
그랬던 봉남이엇기에 묶여진 보리단을 길옆으로 운반 하면서 보리베는 이례의 뒷 궁둥이를 힐끗 힐긋
훔처 보면서 좃꼴림을 느껴갔엇다.
"근디, 느그 행수는 지그 성 조깐 바래다 준다고 나가드마는 한참이 됐는디도 오도 가도 안한다. 지그
성 집까지 따라 갈 참인지 원...."
"......?."
봉남이는 눈을감고 이례를 생각하며 파딱 슨 자지를 가만이 조물락 거리고 있다가는 엄마가 그렇게 중
얼 거리며 방문을 열고 나가자. 감고 있던 눈을 떠가면서 그러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러던 봉남
이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나간다. 그리고서는 신발을 ?아신고 슬금,슬금 새릅문 밖으
로 나간다.
"고단한께 얼렁 잠이나 자제. 자다 말고 뭐하러 그라고 뽈,뽈 기 나가냐이?."
물래에 앉아서 담배 대통에다가 담배를 재워가던 봉남이 엄마가 그러는 봉남이를 향해 그런다.
"암,데도 않가."
봉남이는 그렇게 대답 하면서 새릅문을 벗어나서는 길을 따라 내려간다. 그랬던 봉남이는 얼마전에 삼
례와 달리기를 시합했던 그 장소 가까이 내려 갔을 때, 저 아래에서 일렁이는 등불모습이 보이자 그 자리
에 가만이 서서 바라 보며 기다린다.
그 등불이 10여 미터쯤 가까이 오자 길옆 보리밭에 몸을 숨긴 봉남이는 등불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삼례인 것을 확인하고는 소리죽여 길로 나와 삼례 뒤로 재빠르게 다가서며 "왁-!." 하고 소리처서 삼례를
놀래켜간다.
그바람에 삼례는 경기(驚氣)를 하듯이 기겁을 하고 놀라고는 자신을 그렇게 놀래킨 봉남이를 돌아다 보
며 눈을 허엿게 흘기면서 이런다.
"옴메~. 사람 간 떨어지게 왜근디야."
"히히히~."
봉남이는 히히 거려가며 그러는 삼례를 끌어 안는다.
"오메.오메. 누가 보기라도 하먼 으짤라고...."
삼례가 재빠르게 그렇게 말해가며 그러는 봉남이를 가볍게 때리면서 봉남이 품을 벗어난다. 봉남이가
그러는 삼례를 등뒤에서 다시 끌어 안고 젖가슴을 더듬어 가며 이런다.
"행수우~. 집에는 쪼깐 있다가 가자 이?."
삼례는 그러는 봉남이 말에 대답 대신 들고 있던 등불 유리문을 열고 서둘러 불을 꺼버린다. 그리고서
는 자신의 젖가슴을 주물럭 거리는 봉남이 손등에 자신의 한 손을 포개 가며 이런다.
"오메. 참말로 등불까지 들고 있는디. 여그서 요라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으짤라고 그까이."
"나 시방 행수랑 빽하고 시퍼서 참말로 죽것다."
봉남이는 그러면서 추리닝 바지 속에서 뻣뻣하게 경직 되어있는 자지를 삼례 엉덩이로 붙여간다. 그러
던 봉남이는 궁둥이 윗쪽에 자지가 들이대지자 그렇게 붙여가던 사타구니를 떼내더니 젖가슴을 만지던
오른손을 사타구니사이로 내려서 추리닝 바지를 앞을 들춰가며 발딱 서있는 자지를 잡고 아래로 눌러간
다.
그리고는 무릅을 꾸부려서 자세를 낮춰 가며, 자지 대가리를 삼례 뒷궁둥이 사이로 찔러간다. 자지 대
가리가 삼례 몸뻬 바지 가랭이를 들춰가며 음부(陰部)에 닫자 자지에서 손을 뗀 봉남이는 다시 삼례 젖가
슴을 만저며 마치, 좃질을 하듯이 자지를 움직여간다.
삼례는 자신의 음부에 문질려지는 봉남이 자지가 싫지는 않았던지 몸을 뒤틀거나 궁둥이를 흔들어서
그런 봉남이를 떨처내지 않고 오히려 궁둥이를 뒤로 빼서 그러는 봉남이에게 붙여간다. 그리고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가며 엉거주춤한 자세를 만들고서 그런 봉남이 자지 느낌을 음미라도 하듯이 잠시 가만이 있
다가는 봉남이를 떼내가며 이런다.
"우리 딴데로 가."
삼례가 압장서서 걷는다.
보리밭 밭두렁을 타고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던 삼례는 산밑 어느 한 밀밭으로 들어
간다. 추수를 앞둔 남의 밀밭 밀대를 쓰러뜨러가며 마주 앉은 두사람은 누가 먼저 랄것도 없이 서로 끌어
안기가 바쁘게 입을 포개간다.
삼례의 몸이 뒤로 눕혀지고 봉남이 손이 삼례 저고리 속으로 파고들어 젖가슴을 만저 간다. 근 2분여 남
짖동안 서로의 혀와 입술을 탐하면서 숨소리를 높여가던 두사람의 입이 떨어 지면서 삼례가 이런다.
"오늘은 질게(길게) 오래 하지 말고 얼렁 한번만 해이?. 요새 일하기도 심(힘)든께는 오래 하먼은 기운
다 빠저서 낼 일하다가 쓰러지먼 않뎅께. "
"응."
봉남이는 그러는 삼례에게 고개를 끄떡여가며 대답을 하하면서 삼례가 몸을 밀처내자 상체를 일으켜
간다. 삼례는 봉남이가 몸을 일으키자 들어 누운 그 자세에서 궁둥이를 슬쩍 처들어가며 몸뻬 바지와 빤
쓰를 한꺼번에 궁둥이 아래로 끄집어내려서 다리를 들어 오므려간다. 한쪽 바지 가랭이에서 발을 빼내
서, 발을 빼낸 그 바지 가랭이를 궁둥이 아래에다 갈아가며 다리를 벌리고 무릅을 세워 자세를 잡는다.
봉남이가 무릅 걸음으로 벌려진 삼례 다리 사이로 들어가 자세를 잡고 추리닝 바지와 그 안의 반쓰를
끄집어 내린다. 삼례는 손을 사타구니 사이로 내려서 자신의 가슴위로 엎어저 오는 봉남이 자지를 더듬
어 잡고는 그 끝머리인 귀두를 보지구멍 입구에다가 들이 대주고 손을 떼어 봉남이를 끌어 안는다.
삼례 손이 자지에서 떨어지자 봉남이는 자지를 삼례 보지 속으로 성급하게 찔러간다. 그러자 삼례
가 "아-!." 하는 나지막한 된소리를 내면서 끌어 안은 봉남이 어께를 꽉-!,쥐어간다.
삼례 보지는 미끌거리는 윤활유인 보짓물이 아직 충분히 분비되지 않았던 탓에 그렇게 찔러 들어오는
자지 귀두를 무리없이 받아 들이기에는 역부족 이엇는데도 봉남이가 귀두에 보짓물을 묻히지도 않고 서
둘러 콱-!, 찔러갔기에, 그런 자지 귀두에 부드러운 살꽃입이 엉겨 붙어서 밀려들어가며 삼례에게 아릿한
통증을 안겨 준 것이다.
"아-!. 아-!..."
봉남이 자지가 슬쩍 후퇴 했다가 다시 찔러 들면서 보지 구멍 입구를 넓혀 갈때마다 삼례가 그것에 맞
춰 나지막한 된소리를 내간다. 그러던 삼례는 귀두가 보지 입구를 통과 하고서 보지 속살과 뽀드득-!. 뽀
드득-!.마찰해가며 쑤욱-!.쑥-!. 찔러들어와 자리를 잡고 멈춰서자 보지속을 꽉 채우는 뿌듯한 충만감에
봉남이를 힘주어 안아가며 이런다.
"흐메. 존거어~."
"조아?."
"응."
"나도 조아."
삼례와 그런 말을 주고 받고은 봉남이가 서서히 좃질을 시작한다. 그렇게 서서히 풀무질을 해가는 봉남
이 자지 움짐에 따라 입을 다물고 힘을 써가며 앓듯이 간간이 비음소리를 내가던 삼례는 봉남이 좃질이
빨라저가며 일정한 속도로 규칙적으로 움직여가자 그때 부터서 입이 벌어져가며 거칠어저 가는 숨소리
와 함께 신음성을 토해간다.
돌리고, 팍,팍 내리박고, 귀두만 물리고 깔짝거리는 좃질에 따라 耽?내b는 앓는 듯한 "음!,음!, 하는
신음성과 "하아-!, 하아-!,.."하는 숨소리, 세차게 맞부디치는 사타구니에서 나는 "탁-!,탁-!,탁-!... "하는
소리에 맞춰 마치, 복부를 강타 당하기라도 하듯이 "억-!.억-!...."거리면서 어께를 끌어안은 손에 힘을 넣
어가고, 보지 입구가 짜릿 짜릿 하면서 시큰거리는 그 느낌에는 미치겠다는 듯이 머리를 처들어가며 "엇!.
어허어-!, 어허허-!, 어읏-!,.." 하는 소리를 내간다.
그렇게 삼례의 입에서 감창 소리가 터저 나오게 만들어 가면서 삼례를 쾌감의 늪으로 몰아가던 봉남이
는 삼례를 쾌감의 늪속으로 밀어 넣기도 전에 자신에게 기별이 오면서 좃물이 나올 것 같자 좃질을 멈추
고 잠시 가만이 있으면서 끓어 오르는 쾌감의 강도(强度)를 죽였다가 다시 좃질을 하여간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봉남이 녀석도 씹질을 자주 하다 보니 이제는 예전같이 꼬삐 풀린
망아지처럼 무작정 쾌감의 정상을 향해 치달려서 그냥 좃물을 내 갈기는 것이아니고 칫솟는 흥분의 꼬삐
를 잡아 챌줄도 알아 가는 것이다.
봉남이는 그렇게 사정(射精)이 될 것 같으면 좃질을 멈추고 하는 동작을 반복해가면서 삼례를 쾌감의
늪 낭떠러지에 까지 밀고 갖지만은 삼례와 같이 쾌감의 늪속으로 빠저 들지 못하고 자신이 한발 먼저 쾌
감의 늪속으로 빠저간다. 그러면서 그 짜릿한 쾌감에 비음성(鼻音聲)을 내뱉아가며 좃물을 내 뿜어 버린
다.
삼례는 보지속살을 강타하는 봉남이 좃물을 느껴가며 마치, 괴로워 죽겠다는 듯이 "크으으-!..."하는 소
리를 내가면서 어께를 끌어안고 있던 오른손이 봉남이 궁둥이로 내려 가면서 자신의 궁둥이를 떠올려간
다. 그러면서 맷돌질을 하듯이 요분질을 친다.
그렇게 요분질을 처가며 미진(未盡)했던 쾌감을 높여가던 삼례는 봉남이가 사정(射精)을 거의 끝내갈
무렵에 그녀 자신도 쾌감의 늪속으로 몸을 내던저 간다. 정신이 순간적으로 아찔하는 짜릿한 절정의 쾌감
에 소리를 내 질러가며 봉남이를 사지로 꽈악-!, 옭가메고는 몸을 흠칠,흠칠 떤다.
그렇게 약간의 시차(時差)를 두고서 거의 동시에 절정의 쾌감을 맛본 두사람은 서로 끌어안은체 잠시
가만이 있다가 입을 붙여간다. 잠시 동안 봉남이의 혀를 탐하고 난 삼례가 입을 떼면서 이런다.
"인자 인나."
"않해, 한번 더 하거야."
"오메. 요새 심(힘)들게 일해서 기운도 다 빠쓸람 시롬도 그래?. 아까 저녁에 봉께는 서리 맞은 풀 맹
키롬 맥아리(생기(生氣),)도 한개도 졔躍떪?..."
"시방은 앙그래. "
"옴메. 으째서 시방은 앙근디야. "
"아까는 배가 고파서 그랬당께. 배가 고픈께 심(힘)이 갑짜기 쪽-!, 빠저 부러서 그랬제."
삼례는 그런 봉남이 말이 우습다는 듯이 이런다.
"고래서(그래서) 저녁밥 묵기가 바쁘게 방에 둔너(들어 누워)서 잠들엇써?."
"......"
봉남이는 그런 삼례 말에 아무 대꾸도 않하면서 보지속에 든 자지에 힘을 넣어가며 끄덕 거려간다. 봉
남이는 몸이 피곤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녹초가 될만큼 몸에 피곤이 온 것이 아니고 봉남이
말대로 허기(虛飢)가 진 상태에서 갑짜기 힘이 쭉-!. 빠저 버렸기에 밥을 먹엇써도 금새 몸이 회복 되지
않고 몸이 나른 했기에 그렇게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엇던 것이다.
삼례는 보지속에서 꺼떡거려가는 자지를 느껴가며 그녀 자신도 항문에 힘을 넣어 자지를 조여서 화답
해주며 이런다.
"나는 대련님이 심(힘)들까봐서 글제. 대련님이 더 하고 싶으먼 더해."
하고 말한 삼례는 서서히 보지속에서 자지를 놀려가는 봉남이를 꽉-!. 끌어 안으면서 이런다.
"근디, 자다 말고 나가 나간지 으칫게 알고 그라고 뒤 쫓아 나왔디야?."
그러자 봉남이가 자지 움직임을 멈춰가며 자기 엄마하고 있엇던 일을 말해준다. 삼례는 봉남이가 하는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에 봉남이를 향해 이런다.
"글먼 참말로 요번만 해이?. 엄니한테 나가 늦게 왔다고 뭔소리 않듣게이?."
"응."
봉남이가 대답해가며 좃질을 다시 하자 삼례는 그러는 봉남이를 힘주어 안아가며 이런다.
"흐메. 나가 대련님 각시였쓰먼 참말로 조컷다. 그라먼 요라고 몰래 만나서 앙그래도 되꺼신디..."
삼례는 자신의 속내를 그렇게 내 비춰가며 봉남이 입을 ?는다. 옛 어른들 말에 장작불하고 여자는 들
쑤석거려 건들어 놓으면은 탈이 났다고 하더니 삼례가 지금 그 짝인 것이다.
봉남이의 좃질을 받아가며 들숨과 날숨을 코로 숨가쁘게 내뿜어가던 삼례 입이 떨어지며 "하악-!."하고
가뿐 숨결이 토해진다.
"어~으-!,...어으~헛!.하아!....으메존거~.으메존거어~..."
하는 소리를 내가던 삼례는 봉남이가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좃질을 해가며 자신을 쾌감의 늪속으로 밀
어넣자.
"나, 쨈? 쨈?..."
하는 소리를 내가며 머리를 처들어가며 봉남이에게 엉겨 붙는다. 그러던 삼례가 몸을 경직시켜가며 몸
을 뻣뻣하게 굳혔다가 이내 이완 시켜가며 몸을 흠칠, 거려간다. 그러면서 목구멍 속에서 기어 나오
는 "꺽-!."인지 "억-!."인지 분간키 어려운 딸꾹질 같은 소리를 냈다가 몸을 "흠칠, 거려가는 몸 동작을 반
복한다.
봉남이는 삼례가 쾌감의 늪속에 빠저서 허우적 거려가며 자신의 몸에 꽈악-!. 엉겨 붙는 바람에 좃질을
해대기가 수월챦았지만은 궁둥이를 쉬임없이 놀려간다. 그런 봉남이 궁둥이 놀림에 따라 아랫쪽에서
는 "탁-!,탁-!.탁- !...." 사타구니 살이 가볍게 부딛치는 소리, 물기 머금은 보지가 쉬임없이 들랑거리는 자
지와 마찰해 가는 "쭈쫙-!.쭈쫙-!,쭈쫙-!..." 거리는 소리가 나고, 윗쪽에서는 삼례가 쾌감의 늪에 빠저서
허우적 거려가며 내는 딸국질 소리, 봉남이가 내붐는 "헉-!,헉-!,헉-!,..." 하는 거친 숨소리가 한동안 어
우러 다가는 봉남이가 그 움직임을 멈춰가며 내는 쾌감에 저린 비음성(鼻音聲)을 끝으로 밀밭을 가볍
게 어루만지면서 스처가는 밤 바람에 그 소리가 실려가듯이 이내 조용해진다.
제6장
"대련님. 대련님."
저녁밥을 먹기가 바쁘게 방에 들어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엇던 봉남이는 삼례가 자신을 부르며 가만이
흔드는 손길에 눈을 뜬다.
"대련님 후라시(손전등)있제?."
"쩌그...."
봉남이는 한참 달게 잠을 자는데 그렇게 삼례가 깨워서 묻자 잠뜻을 하듯이 그렇게 옹알거려가며 앉은
뱅이 책상을 가리키고는 그러는 삼례가 귀챦다는 듯이 몸을 돌려 눕고는 다시 잠속으로 빠저든다. 삼례
는 봉남이가 가르킨 앉은뱅이 책상 설합을 열어 손전등을 ?아들고 자신이 들어왔던 방에서 정재로 통하
는 작은 샛문을 통해 정재로 나간다.
그랬던 삼례는 정재에 걸려 있던 등불을 내려 손에 들고는 이례와 같이 정재를 나와 문래에 앉아서 담
배를 피우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시키고는 이례를 바래다 주고 오겠다고 하고서는 이례와 같
이 집을 나간다.
요새 몇일째 봉남이네 집 보리베기 일이 계속 되고 있엇는데 오늘 이례가 와서 일을 했다. 이례는 같은
동네가 아니였기에 일을 마치자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삼례가 한사코 붙잡는 바람에 봉남이 집으로 왔던
것이다.
그랬던 이례는 높(일꾼)들이 저녁밥을 먹고서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아서 삼례가 하는 설것이 일
을 도와 주고 서 느즈막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삼례가 그런 이례에게 손전등을 가지고 가게 하려고
봉남이를 깨워서 손전등을 가저 갔던 것이다.
그렇게 삼례가 이례를 바래다 준다고 나간지 얼마쯤 지났을 때, 봉남이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서는 이불
도 덮지方?맨 방바닥에서 곤히 자고 있는 봉남이에게 이불을 덮어 줘가며 "잘라먼 이불 피고 좋게 팬하
게 자든가 글제. 요고시 요새 일 쪼깐 하드마는 된(피곤)가 보네. 아이고 내 새끼. 요새 욕(고생)본다. 욕
봐." 그러면서 봉남이를 다둑거려간다.
봉남이 엄마로써는 요즘 같이 일손이 딸린 마당에 봉남이가 벌써 한몫을 톡톡히 해내니 참으로 오졌던
것이다. 품앗시 온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으면서 봉남이가 일잘한다고 하면서 품 값을 때 순호 대신 봉남
이를 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몰론 그것이 우스개 소리였지만 봉남이는 진짜 열심히 했다. 보리논 한 두렁씩 차고서 보리를 베기 시
작하면은 제일 먼저 다 베고서는 묶어놓은 보리 다발을 길옆으로 옴겨 놨다. 일꾼들이 그런 봉남이를 보
고 잘한다.잘한다 치켜세워주니까 봉남이는 더 신이나서 더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봉남이처
럼 벼락치기로 일을 하다보며 몸이 쉬이 지치는 법이고, 저녁 무렵에는 갑짜기 허기(虛飢)가 지면서 기운
이 쭉-!. 빠졌던 것이다.
봉남이는 엄마의 그런 소리와 자신을 건드리는 손길에 잠자다 말고 일어나더니 정재로 통하는 샛문을
열고 나간다.
"자다 말고 정재는 왜가냐이?."
"물 묵을라고."
"나한테 떠다 달라 글제."
봉남이는 허기(虛飢)지고 배가 고팟기에 저녁밥을 좀 짜게 먹엇는지 물이 쓰인 것이다. 물 한 대접을 단
숨에 마서가는 봉남이는 물이 꿀맛같이 달다고 느낀다..
"행수 성은 갔어?."
물을 한 대접 먹고 대접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들어오면서 봉남이가 묻는다.
"응. 아까 전에 갔다."
봉남이는 그런 엄마 말을 들으며 이불속에 몸을 눕혀간다. 그러면서 이례를 생각한다. 이례는 얼마 전
에 봉남이와 그일이 있고나서 봉남이와 다시 만났지만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외면을 했
다.
이례로써는 이유야 어찌 되엇던 간에 봉남이에게 자신의 첫 순결을 바친터라 봉남이와 눈을 마주치기
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례는 자신에게 향해지는 봉남이의 시선을 자주 느꼈다.
봉남이는 그일(들킬뻔한일)이 있고나서부터 삼례와 씹질도 한동안 않한 탓인지 자신과 살섞음을 한번
했던 이례에게 관심이 갔던 것이다. 봉남이가 이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인 것은, 배불리 먹을것이 있을
때는 맛없는 것을 내버려두고 잊고 있다가 배고플 때 아쉬워서 그걸 다시 ?는 마음이엇다.
그랬던 봉남이엇기에 묶여진 보리단을 길옆으로 운반 하면서 보리베는 이례의 뒷 궁둥이를 힐끗 힐긋
훔처 보면서 좃꼴림을 느껴갔엇다.
"근디, 느그 행수는 지그 성 조깐 바래다 준다고 나가드마는 한참이 됐는디도 오도 가도 안한다. 지그
성 집까지 따라 갈 참인지 원...."
"......?."
봉남이는 눈을감고 이례를 생각하며 파딱 슨 자지를 가만이 조물락 거리고 있다가는 엄마가 그렇게 중
얼 거리며 방문을 열고 나가자. 감고 있던 눈을 떠가면서 그러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러던 봉남
이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나간다. 그리고서는 신발을 ?아신고 슬금,슬금 새릅문 밖으
로 나간다.
"고단한께 얼렁 잠이나 자제. 자다 말고 뭐하러 그라고 뽈,뽈 기 나가냐이?."
물래에 앉아서 담배 대통에다가 담배를 재워가던 봉남이 엄마가 그러는 봉남이를 향해 그런다.
"암,데도 않가."
봉남이는 그렇게 대답 하면서 새릅문을 벗어나서는 길을 따라 내려간다. 그랬던 봉남이는 얼마전에 삼
례와 달리기를 시합했던 그 장소 가까이 내려 갔을 때, 저 아래에서 일렁이는 등불모습이 보이자 그 자리
에 가만이 서서 바라 보며 기다린다.
그 등불이 10여 미터쯤 가까이 오자 길옆 보리밭에 몸을 숨긴 봉남이는 등불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삼례인 것을 확인하고는 소리죽여 길로 나와 삼례 뒤로 재빠르게 다가서며 "왁-!." 하고 소리처서 삼례를
놀래켜간다.
그바람에 삼례는 경기(驚氣)를 하듯이 기겁을 하고 놀라고는 자신을 그렇게 놀래킨 봉남이를 돌아다 보
며 눈을 허엿게 흘기면서 이런다.
"옴메~. 사람 간 떨어지게 왜근디야."
"히히히~."
봉남이는 히히 거려가며 그러는 삼례를 끌어 안는다.
"오메.오메. 누가 보기라도 하먼 으짤라고...."
삼례가 재빠르게 그렇게 말해가며 그러는 봉남이를 가볍게 때리면서 봉남이 품을 벗어난다. 봉남이가
그러는 삼례를 등뒤에서 다시 끌어 안고 젖가슴을 더듬어 가며 이런다.
"행수우~. 집에는 쪼깐 있다가 가자 이?."
삼례는 그러는 봉남이 말에 대답 대신 들고 있던 등불 유리문을 열고 서둘러 불을 꺼버린다. 그리고서
는 자신의 젖가슴을 주물럭 거리는 봉남이 손등에 자신의 한 손을 포개 가며 이런다.
"오메. 참말로 등불까지 들고 있는디. 여그서 요라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으짤라고 그까이."
"나 시방 행수랑 빽하고 시퍼서 참말로 죽것다."
봉남이는 그러면서 추리닝 바지 속에서 뻣뻣하게 경직 되어있는 자지를 삼례 엉덩이로 붙여간다. 그러
던 봉남이는 궁둥이 윗쪽에 자지가 들이대지자 그렇게 붙여가던 사타구니를 떼내더니 젖가슴을 만지던
오른손을 사타구니사이로 내려서 추리닝 바지를 앞을 들춰가며 발딱 서있는 자지를 잡고 아래로 눌러간
다.
그리고는 무릅을 꾸부려서 자세를 낮춰 가며, 자지 대가리를 삼례 뒷궁둥이 사이로 찔러간다. 자지 대
가리가 삼례 몸뻬 바지 가랭이를 들춰가며 음부(陰部)에 닫자 자지에서 손을 뗀 봉남이는 다시 삼례 젖가
슴을 만저며 마치, 좃질을 하듯이 자지를 움직여간다.
삼례는 자신의 음부에 문질려지는 봉남이 자지가 싫지는 않았던지 몸을 뒤틀거나 궁둥이를 흔들어서
그런 봉남이를 떨처내지 않고 오히려 궁둥이를 뒤로 빼서 그러는 봉남이에게 붙여간다. 그리고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가며 엉거주춤한 자세를 만들고서 그런 봉남이 자지 느낌을 음미라도 하듯이 잠시 가만이 있
다가는 봉남이를 떼내가며 이런다.
"우리 딴데로 가."
삼례가 압장서서 걷는다.
보리밭 밭두렁을 타고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던 삼례는 산밑 어느 한 밀밭으로 들어
간다. 추수를 앞둔 남의 밀밭 밀대를 쓰러뜨러가며 마주 앉은 두사람은 누가 먼저 랄것도 없이 서로 끌어
안기가 바쁘게 입을 포개간다.
삼례의 몸이 뒤로 눕혀지고 봉남이 손이 삼례 저고리 속으로 파고들어 젖가슴을 만저 간다. 근 2분여 남
짖동안 서로의 혀와 입술을 탐하면서 숨소리를 높여가던 두사람의 입이 떨어 지면서 삼례가 이런다.
"오늘은 질게(길게) 오래 하지 말고 얼렁 한번만 해이?. 요새 일하기도 심(힘)든께는 오래 하먼은 기운
다 빠저서 낼 일하다가 쓰러지먼 않뎅께. "
"응."
봉남이는 그러는 삼례에게 고개를 끄떡여가며 대답을 하하면서 삼례가 몸을 밀처내자 상체를 일으켜
간다. 삼례는 봉남이가 몸을 일으키자 들어 누운 그 자세에서 궁둥이를 슬쩍 처들어가며 몸뻬 바지와 빤
쓰를 한꺼번에 궁둥이 아래로 끄집어내려서 다리를 들어 오므려간다. 한쪽 바지 가랭이에서 발을 빼내
서, 발을 빼낸 그 바지 가랭이를 궁둥이 아래에다 갈아가며 다리를 벌리고 무릅을 세워 자세를 잡는다.
봉남이가 무릅 걸음으로 벌려진 삼례 다리 사이로 들어가 자세를 잡고 추리닝 바지와 그 안의 반쓰를
끄집어 내린다. 삼례는 손을 사타구니 사이로 내려서 자신의 가슴위로 엎어저 오는 봉남이 자지를 더듬
어 잡고는 그 끝머리인 귀두를 보지구멍 입구에다가 들이 대주고 손을 떼어 봉남이를 끌어 안는다.
삼례 손이 자지에서 떨어지자 봉남이는 자지를 삼례 보지 속으로 성급하게 찔러간다. 그러자 삼례
가 "아-!." 하는 나지막한 된소리를 내면서 끌어 안은 봉남이 어께를 꽉-!,쥐어간다.
삼례 보지는 미끌거리는 윤활유인 보짓물이 아직 충분히 분비되지 않았던 탓에 그렇게 찔러 들어오는
자지 귀두를 무리없이 받아 들이기에는 역부족 이엇는데도 봉남이가 귀두에 보짓물을 묻히지도 않고 서
둘러 콱-!, 찔러갔기에, 그런 자지 귀두에 부드러운 살꽃입이 엉겨 붙어서 밀려들어가며 삼례에게 아릿한
통증을 안겨 준 것이다.
"아-!. 아-!..."
봉남이 자지가 슬쩍 후퇴 했다가 다시 찔러 들면서 보지 구멍 입구를 넓혀 갈때마다 삼례가 그것에 맞
춰 나지막한 된소리를 내간다. 그러던 삼례는 귀두가 보지 입구를 통과 하고서 보지 속살과 뽀드득-!. 뽀
드득-!.마찰해가며 쑤욱-!.쑥-!. 찔러들어와 자리를 잡고 멈춰서자 보지속을 꽉 채우는 뿌듯한 충만감에
봉남이를 힘주어 안아가며 이런다.
"흐메. 존거어~."
"조아?."
"응."
"나도 조아."
삼례와 그런 말을 주고 받고은 봉남이가 서서히 좃질을 시작한다. 그렇게 서서히 풀무질을 해가는 봉남
이 자지 움짐에 따라 입을 다물고 힘을 써가며 앓듯이 간간이 비음소리를 내가던 삼례는 봉남이 좃질이
빨라저가며 일정한 속도로 규칙적으로 움직여가자 그때 부터서 입이 벌어져가며 거칠어저 가는 숨소리
와 함께 신음성을 토해간다.
돌리고, 팍,팍 내리박고, 귀두만 물리고 깔짝거리는 좃질에 따라 耽?내b는 앓는 듯한 "음!,음!, 하는
신음성과 "하아-!, 하아-!,.."하는 숨소리, 세차게 맞부디치는 사타구니에서 나는 "탁-!,탁-!,탁-!... "하는
소리에 맞춰 마치, 복부를 강타 당하기라도 하듯이 "억-!.억-!...."거리면서 어께를 끌어안은 손에 힘을 넣
어가고, 보지 입구가 짜릿 짜릿 하면서 시큰거리는 그 느낌에는 미치겠다는 듯이 머리를 처들어가며 "엇!.
어허어-!, 어허허-!, 어읏-!,.." 하는 소리를 내간다.
그렇게 삼례의 입에서 감창 소리가 터저 나오게 만들어 가면서 삼례를 쾌감의 늪으로 몰아가던 봉남이
는 삼례를 쾌감의 늪속으로 밀어 넣기도 전에 자신에게 기별이 오면서 좃물이 나올 것 같자 좃질을 멈추
고 잠시 가만이 있으면서 끓어 오르는 쾌감의 강도(强度)를 죽였다가 다시 좃질을 하여간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봉남이 녀석도 씹질을 자주 하다 보니 이제는 예전같이 꼬삐 풀린
망아지처럼 무작정 쾌감의 정상을 향해 치달려서 그냥 좃물을 내 갈기는 것이아니고 칫솟는 흥분의 꼬삐
를 잡아 챌줄도 알아 가는 것이다.
봉남이는 그렇게 사정(射精)이 될 것 같으면 좃질을 멈추고 하는 동작을 반복해가면서 삼례를 쾌감의
늪 낭떠러지에 까지 밀고 갖지만은 삼례와 같이 쾌감의 늪속으로 빠저 들지 못하고 자신이 한발 먼저 쾌
감의 늪속으로 빠저간다. 그러면서 그 짜릿한 쾌감에 비음성(鼻音聲)을 내뱉아가며 좃물을 내 뿜어 버린
다.
삼례는 보지속살을 강타하는 봉남이 좃물을 느껴가며 마치, 괴로워 죽겠다는 듯이 "크으으-!..."하는 소
리를 내가면서 어께를 끌어안고 있던 오른손이 봉남이 궁둥이로 내려 가면서 자신의 궁둥이를 떠올려간
다. 그러면서 맷돌질을 하듯이 요분질을 친다.
그렇게 요분질을 처가며 미진(未盡)했던 쾌감을 높여가던 삼례는 봉남이가 사정(射精)을 거의 끝내갈
무렵에 그녀 자신도 쾌감의 늪속으로 몸을 내던저 간다. 정신이 순간적으로 아찔하는 짜릿한 절정의 쾌감
에 소리를 내 질러가며 봉남이를 사지로 꽈악-!, 옭가메고는 몸을 흠칠,흠칠 떤다.
그렇게 약간의 시차(時差)를 두고서 거의 동시에 절정의 쾌감을 맛본 두사람은 서로 끌어안은체 잠시
가만이 있다가 입을 붙여간다. 잠시 동안 봉남이의 혀를 탐하고 난 삼례가 입을 떼면서 이런다.
"인자 인나."
"않해, 한번 더 하거야."
"오메. 요새 심(힘)들게 일해서 기운도 다 빠쓸람 시롬도 그래?. 아까 저녁에 봉께는 서리 맞은 풀 맹
키롬 맥아리(생기(生氣),)도 한개도 졔躍떪?..."
"시방은 앙그래. "
"옴메. 으째서 시방은 앙근디야. "
"아까는 배가 고파서 그랬당께. 배가 고픈께 심(힘)이 갑짜기 쪽-!, 빠저 부러서 그랬제."
삼례는 그런 봉남이 말이 우습다는 듯이 이런다.
"고래서(그래서) 저녁밥 묵기가 바쁘게 방에 둔너(들어 누워)서 잠들엇써?."
"......"
봉남이는 그런 삼례 말에 아무 대꾸도 않하면서 보지속에 든 자지에 힘을 넣어가며 끄덕 거려간다. 봉
남이는 몸이 피곤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녹초가 될만큼 몸에 피곤이 온 것이 아니고 봉남이
말대로 허기(虛飢)가 진 상태에서 갑짜기 힘이 쭉-!. 빠저 버렸기에 밥을 먹엇써도 금새 몸이 회복 되지
않고 몸이 나른 했기에 그렇게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엇던 것이다.
삼례는 보지속에서 꺼떡거려가는 자지를 느껴가며 그녀 자신도 항문에 힘을 넣어 자지를 조여서 화답
해주며 이런다.
"나는 대련님이 심(힘)들까봐서 글제. 대련님이 더 하고 싶으먼 더해."
하고 말한 삼례는 서서히 보지속에서 자지를 놀려가는 봉남이를 꽉-!. 끌어 안으면서 이런다.
"근디, 자다 말고 나가 나간지 으칫게 알고 그라고 뒤 쫓아 나왔디야?."
그러자 봉남이가 자지 움직임을 멈춰가며 자기 엄마하고 있엇던 일을 말해준다. 삼례는 봉남이가 하는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에 봉남이를 향해 이런다.
"글먼 참말로 요번만 해이?. 엄니한테 나가 늦게 왔다고 뭔소리 않듣게이?."
"응."
봉남이가 대답해가며 좃질을 다시 하자 삼례는 그러는 봉남이를 힘주어 안아가며 이런다.
"흐메. 나가 대련님 각시였쓰먼 참말로 조컷다. 그라먼 요라고 몰래 만나서 앙그래도 되꺼신디..."
삼례는 자신의 속내를 그렇게 내 비춰가며 봉남이 입을 ?는다. 옛 어른들 말에 장작불하고 여자는 들
쑤석거려 건들어 놓으면은 탈이 났다고 하더니 삼례가 지금 그 짝인 것이다.
봉남이의 좃질을 받아가며 들숨과 날숨을 코로 숨가쁘게 내뿜어가던 삼례 입이 떨어지며 "하악-!."하고
가뿐 숨결이 토해진다.
"어~으-!,...어으~헛!.하아!....으메존거~.으메존거어~..."
하는 소리를 내가던 삼례는 봉남이가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좃질을 해가며 자신을 쾌감의 늪속으로 밀
어넣자.
"나, 쨈? 쨈?..."
하는 소리를 내가며 머리를 처들어가며 봉남이에게 엉겨 붙는다. 그러던 삼례가 몸을 경직시켜가며 몸
을 뻣뻣하게 굳혔다가 이내 이완 시켜가며 몸을 흠칠, 거려간다. 그러면서 목구멍 속에서 기어 나오
는 "꺽-!."인지 "억-!."인지 분간키 어려운 딸꾹질 같은 소리를 냈다가 몸을 "흠칠, 거려가는 몸 동작을 반
복한다.
봉남이는 삼례가 쾌감의 늪속에 빠저서 허우적 거려가며 자신의 몸에 꽈악-!. 엉겨 붙는 바람에 좃질을
해대기가 수월챦았지만은 궁둥이를 쉬임없이 놀려간다. 그런 봉남이 궁둥이 놀림에 따라 아랫쪽에서
는 "탁-!,탁-!.탁- !...." 사타구니 살이 가볍게 부딛치는 소리, 물기 머금은 보지가 쉬임없이 들랑거리는 자
지와 마찰해 가는 "쭈쫙-!.쭈쫙-!,쭈쫙-!..." 거리는 소리가 나고, 윗쪽에서는 삼례가 쾌감의 늪에 빠저서
허우적 거려가며 내는 딸국질 소리, 봉남이가 내붐는 "헉-!,헉-!,헉-!,..." 하는 거친 숨소리가 한동안 어
우러 다가는 봉남이가 그 움직임을 멈춰가며 내는 쾌감에 저린 비음성(鼻音聲)을 끝으로 밀밭을 가볍
게 어루만지면서 스처가는 밤 바람에 그 소리가 실려가듯이 이내 조용해진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9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9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