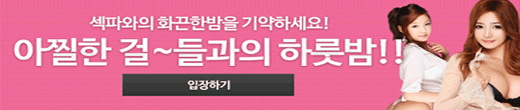사람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있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인생의 과정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비켜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의도하지 않게
그 아이와 같은 밤을 보낸 후 나는 더 이상의 나가 아니었다. 마치 그 아이의 일부인 것처
럼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이 있어야만 내가 되어질 것만 같았다. 목요일도 끝나고 금요일에
그 아이에게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가 가는 것을 채 듣기도 전에 끊어
버리고선 다시 문자를 보냈다.
‘상담을 해야 하니 오늘 아홉시에 올 수 있니?’
문자를 보내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취소할 수가 없었고 후회감을 넘어 ‘혹시’
하는 맘으로 일찌감치 오피스텔로 돌아가 기다렸다. 안 오기를 바라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시계가 있는 벽 쪽으로 갔고 아홉시가 다가오자 초조함에 거의 미쳐버리는 듯 하였다. 여덟
시 오 십 팔분에서 오 십 구분으로 넘어가고 아홉시가 되자 의미모를 한숨이 나왔지만 결국
시계에서 눈을 떼지는 못했다. 오분 쯤 있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피곤함에 누워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문을 열고 말했다.
‘누구니?’
그러고는 아차 싶었다. 누구라고 말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으니 뭐라고 생각할까? 또 다른
한숨이 나왔지만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는 그 애를 보자 얼
른 정신을 차리고 괜찮다며 오피스텔로 데리고 들어 왔고 명색이 상담이니 일단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고 과외비를 안받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가정 형편을 이유로 대며 매일 스
터디를 하자고 말했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내심 고마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아이
역시 어머니의 고생에 보답을 드리고 싶었을 게다. 그렇게나마 마음의 짐을 던 나는 흐뭇해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고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나를 어쩔 수가 없었다.
아직 차가 다닐 시간이었고 눈도 길을 막지는 않았지만 차마 가라는 말을 못했다. 아니 어
떻하면 같이 있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애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속이 탔다. 담배를 피고 싶었지만 입안이 이미
말라버려 불 붙였던 담배를 바로 꺼버리고선 어느새 바닥난 컵에 물을 채우러 냉장고로 갔
다. 두 컵이나 연거푸 마시고선 그 아이에게로 가려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발이 얼
어버렸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가녀린 손과 희디흰 목덜미가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난 갑자기 불을 꺼버렸고 어둠이 눈에 익은 뒤에도 한참을 그렇게 서있었다. 하지만 그 아
이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오히려 내 숨소리만 거칠어져갔다. 그래도 최대한의
인내를 하며 조용히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팔을 끄니 어느새 내 품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나는 사형직전에 형 집행을 정지 받은 것처럼 해방감에 들떠
있었다.
며칠 전 그 아이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준 것을 생각하고선 침대로 갔고 교복을 입은 채
로 내 팔에 뉘었다. 그 날은 자신 있게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다
만 눈을 꼭 감은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든지 있는 힘
을 다해 꽉 끌어안았고 팔이 아플 때가 되어서야 다시금 옆에 뉘었다. 그런데 이상한건 그
렇게 꼭 안았는데도 그 가녀린 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 아이를 보는 것이 기쁨이었고 숨소리와 심장이 떨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었으며 내 옆에 그 아이가 있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원래가 나의 것이었으며 서로의 존재를 알기에 당연히 이 세
상을 살아간다는 듯이...
가만히 손을 들어 감고 있는 그 아이의 눈을 만졌다. 눈썹이 떨리었고 늪에서 전기뱀장어를
건드린 듯한 느낌에 오히려 내가 놀랐다. 분명 그 아이의 머리는 내 팔위에 있었건만 이건
또 무슨 경우란 말인가? 내 팔에 이미 그 아이가 닿아있었는데 단순히 눈을 만졌다고 다른
손에선 마치 감전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그 놀람에 가만히 있었지만 그 아이를 보는
눈길만은 그치지 않았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볼을 만졌고 믿을 수 없을만한 부드러움에 오
히려 소름이 돋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부드러움에 순식간에 중독 되고 말았고 만지면 그대로 부셔져버릴 것만
같은 목을 어루만졌고 숨 막힐 듯 천천히 손을 밑으로 내렸지만 차마 그 아이의 가슴에 이
르지는 못하고 그 아이의 팔을 가만가만 만지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든 듯 그 아이의 교복
웃옷을 벗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였으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의
거절의 뜻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겉옷을 벗기는 내 손길을 따라 몸은 조금씩 들려졌고
쉽게 옷을 벗길 수 있었다. 가로등에 비친 그 아이의 브라우스가 하얀 듯 붉은 색을 띄고
있었고 난 마치 그 속을 보겠다는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아이의 가슴께를 보았다. 조용
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아이의 가슴은 나를 최면에 걸리게 했고 나는 그 최면에서 벗어나
지도 못한 채 그 아이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대었다. 그 아이 역시 심장이 급격하게 뛰고
있었고 내가 손을 떼자마자 죽을 것처럼 느껴졌기에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브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지만 단추를 모두 풀도록 그 아이는 가만히 있었고 난 그
흰 옷을 벗길 엄두도 못낸 채 가만히 있기만 했다. 그러다 그 아이의 가슴에 귀를 갖다대었
고 그 아이의 심장이 그 아이를 대신해 말하듯 나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가 만년
설에 둘러 갇힌 듯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떨며 그 아이의 브라우스를 젖히자 그보다
더 하얀 그녀의 속살이 눈을 시리게 했고 목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인생의 과정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비켜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의도하지 않게
그 아이와 같은 밤을 보낸 후 나는 더 이상의 나가 아니었다. 마치 그 아이의 일부인 것처
럼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이 있어야만 내가 되어질 것만 같았다. 목요일도 끝나고 금요일에
그 아이에게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가 가는 것을 채 듣기도 전에 끊어
버리고선 다시 문자를 보냈다.
‘상담을 해야 하니 오늘 아홉시에 올 수 있니?’
문자를 보내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취소할 수가 없었고 후회감을 넘어 ‘혹시’
하는 맘으로 일찌감치 오피스텔로 돌아가 기다렸다. 안 오기를 바라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시계가 있는 벽 쪽으로 갔고 아홉시가 다가오자 초조함에 거의 미쳐버리는 듯 하였다. 여덟
시 오 십 팔분에서 오 십 구분으로 넘어가고 아홉시가 되자 의미모를 한숨이 나왔지만 결국
시계에서 눈을 떼지는 못했다. 오분 쯤 있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피곤함에 누워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문을 열고 말했다.
‘누구니?’
그러고는 아차 싶었다. 누구라고 말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으니 뭐라고 생각할까? 또 다른
한숨이 나왔지만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는 그 애를 보자 얼
른 정신을 차리고 괜찮다며 오피스텔로 데리고 들어 왔고 명색이 상담이니 일단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고 과외비를 안받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가정 형편을 이유로 대며 매일 스
터디를 하자고 말했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내심 고마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아이
역시 어머니의 고생에 보답을 드리고 싶었을 게다. 그렇게나마 마음의 짐을 던 나는 흐뭇해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고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나를 어쩔 수가 없었다.
아직 차가 다닐 시간이었고 눈도 길을 막지는 않았지만 차마 가라는 말을 못했다. 아니 어
떻하면 같이 있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애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속이 탔다. 담배를 피고 싶었지만 입안이 이미
말라버려 불 붙였던 담배를 바로 꺼버리고선 어느새 바닥난 컵에 물을 채우러 냉장고로 갔
다. 두 컵이나 연거푸 마시고선 그 아이에게로 가려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발이 얼
어버렸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가녀린 손과 희디흰 목덜미가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난 갑자기 불을 꺼버렸고 어둠이 눈에 익은 뒤에도 한참을 그렇게 서있었다. 하지만 그 아
이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오히려 내 숨소리만 거칠어져갔다. 그래도 최대한의
인내를 하며 조용히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팔을 끄니 어느새 내 품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나는 사형직전에 형 집행을 정지 받은 것처럼 해방감에 들떠
있었다.
며칠 전 그 아이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준 것을 생각하고선 침대로 갔고 교복을 입은 채
로 내 팔에 뉘었다. 그 날은 자신 있게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다
만 눈을 꼭 감은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든지 있는 힘
을 다해 꽉 끌어안았고 팔이 아플 때가 되어서야 다시금 옆에 뉘었다. 그런데 이상한건 그
렇게 꼭 안았는데도 그 가녀린 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 아이를 보는 것이 기쁨이었고 숨소리와 심장이 떨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었으며 내 옆에 그 아이가 있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원래가 나의 것이었으며 서로의 존재를 알기에 당연히 이 세
상을 살아간다는 듯이...
가만히 손을 들어 감고 있는 그 아이의 눈을 만졌다. 눈썹이 떨리었고 늪에서 전기뱀장어를
건드린 듯한 느낌에 오히려 내가 놀랐다. 분명 그 아이의 머리는 내 팔위에 있었건만 이건
또 무슨 경우란 말인가? 내 팔에 이미 그 아이가 닿아있었는데 단순히 눈을 만졌다고 다른
손에선 마치 감전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그 놀람에 가만히 있었지만 그 아이를 보는
눈길만은 그치지 않았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볼을 만졌고 믿을 수 없을만한 부드러움에 오
히려 소름이 돋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부드러움에 순식간에 중독 되고 말았고 만지면 그대로 부셔져버릴 것만
같은 목을 어루만졌고 숨 막힐 듯 천천히 손을 밑으로 내렸지만 차마 그 아이의 가슴에 이
르지는 못하고 그 아이의 팔을 가만가만 만지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든 듯 그 아이의 교복
웃옷을 벗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였으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의
거절의 뜻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겉옷을 벗기는 내 손길을 따라 몸은 조금씩 들려졌고
쉽게 옷을 벗길 수 있었다. 가로등에 비친 그 아이의 브라우스가 하얀 듯 붉은 색을 띄고
있었고 난 마치 그 속을 보겠다는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아이의 가슴께를 보았다. 조용
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아이의 가슴은 나를 최면에 걸리게 했고 나는 그 최면에서 벗어나
지도 못한 채 그 아이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대었다. 그 아이 역시 심장이 급격하게 뛰고
있었고 내가 손을 떼자마자 죽을 것처럼 느껴졌기에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브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지만 단추를 모두 풀도록 그 아이는 가만히 있었고 난 그
흰 옷을 벗길 엄두도 못낸 채 가만히 있기만 했다. 그러다 그 아이의 가슴에 귀를 갖다대었
고 그 아이의 심장이 그 아이를 대신해 말하듯 나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가 만년
설에 둘러 갇힌 듯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떨며 그 아이의 브라우스를 젖히자 그보다
더 하얀 그녀의 속살이 눈을 시리게 했고 목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6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6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