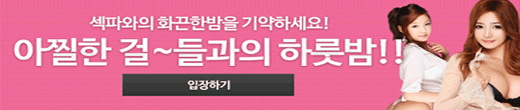공사장에 핀 꽃(2)
2부
“띠릴리리!”
전화벨소리가 들렸지만 움직이기도 싫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받어 ? 창규형 엄마래.”
“난데, 낼 아침 여섯시에 전철역으로 나와, 편한 옷 한 벌 싸가지구 그럼, 내일 보자~ 딸깍!”
아침 일찍 서둘러 전철역을 향했다. 저만치 손을 흔드는 창규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몇 번을 부탁해서 어렵게 난 자리야.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잘 나와야 돼! 일하다 힘들면 좀 쉬면서 요령껏 하고…”
친절히 당부의 말도 잊지않는 창규엄마가 고마웠다.
잠시 후 그녀들 앞으로 봉고차 한대가 도착했다.
“드르륵”, ”타세요!”
인사할 겨를도 없이 문이 열리며 창규엄마가 얼른 타라는 듯이 등을 떠밀었다.
차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타고 있었고, 아침인데도 땀냄새에 머리냄새 등이 범벅이 되어 코를 찔렀다. 좁게 껴 앉아 가는 차 안에서 운전석남자와 옆자리 남자가 힐끗힐끗 영호엄마를 곁눈질했다.
“영호엄마!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창규엄마가 말했다.
창규엄마를 따라가니 현장 한 구퉁이에 임시로 판자를 붙여 만든 간이 칸막이식 창고가 있었다. 컴컴한 창고 안 - 익숙하게 천정에 벽열등을 켜는 창규엄마, 문을 닫고는 빠르게 옷을 벗는다. 잠금 장치 하나 없는 칸막이 안에서 스스럼없이 덜렁 팬티, 브라쟈만 남은 창규엄마 앞에서 머뭇거리는 영호엄마
“뭐 해? 얼른 갈아입지 않고?”
이윽고, 엉거주춤 옷을 벗는 영호엄마였다. 영호엄마가 손을 뻗어 머리위로 티셔츠를 당기는 순간 “털렁!”하며 아이머리만 한 유방이 작은 가리개에 겨우 붙잡힌 체 출렁였다.
“와~아!” 그때였다. 분명 남자소리 였다.
누군가 문틈사이로 몰래 지켜보다 영호엄마의 큰 가슴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낸 것이다.
“너 새끼 저리못가!”
앙칼진 창규엄마의 고성이 이어졌고, “후다닥!” 달음질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놀랐지? 장 씨라고 그 사람 아들래민데 약간 모자라, 저렇게 가끔 엿본다니까…궁금한가 봐.”
“열 일곱이지 아마. 그 애가 저 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장 씨에게 말했더니, 아이를 반죽일 만큼 패더라. 그 뒤로는 더러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곤 했었는데 또 저러네…” 창규엄마가 농담 섞인 말로 애써 설명했다.
“자아~, 다들 인사하지. 이번에 김 아줌마 소개로 오신 성이…박! 박 아줌마라 하죠 뭐, 인사들 나누세요.”
소장이다. 이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십대에서 오십대까지 다양한 연령에 식구들은 모두 열 다섯이 전부였다. ‘저 앳된 소년이 아까 그…’ 키는 껑충하지만 얼굴은 앳된 소년과 날카로운 콧날의 장 씨가 나란히 서 있었다.
각기 일을 맡아 뿔뿔이 흩어지고, 영호엄마는 상호라는 총각과 한조가 되었다.
“아줌마! 드릴 좀 집어 줘요.” 상호 총각은 친절했다. 묵묵히 일도 열심히 하고, 이따금씩 공구 이름을 알려주며 편하게 대하려 애쓰는 게 착한 총각 같았다.
점심시간 ? 함바집으로 모여든 건장한 사내들이 산처럼 퍼 담은 밥을 떠넣고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 창규엄마를 다르니, 그 곳에는 이미 여럿이 모여 있었다. 널 부러져 잠자는 사람들 옆을 지나 화투 판 곁에 쓸쩍 자리를 잡았다.
“이제 와요?”
젊은 사내가 창규엄마를 아는 체 하자 모두 고개를 들어 창규엄마 일행을 쳐다보았다.
“잠깐 여기 앉아 구경 좀 해” 머뭇거리며 서 있는 모습에 창규엄마가 손을 당겼다.
이미 판이 무르익었는지 여기 저기 만원 권 지폐가 수북하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저리 많아?"하는 생각으로 휘둥그래 할 동안에도 제법 거세게 돈이 오갔다. 그 중에 창규엄마는 갖은 아양과 애교를 섞어가며 조금씩 고리를 뜯어냈다.
이십여분이 지났을까…모르긴 몰라도 창규엄마의 주머니로 이,삼만원은 족히 들어갔나 보다.
“나 물 좀 버리고 올께!”
아까 그 젊은 사내가 주섬주섬 돈을 챙기며 일어섰다.
“영호엄마! 이리 앉아, 내 대신 고리 좀 뗘… 괜찮아…”
잠시 후, 창규엄마가 일어서며 말했다. 싫은 표정의 영호엄마를 억지로 끼어 앉혀 놓고는 슬그머니 빠져 나갔다.
“저 자식! 또 떡 치러 가네, 돈 벌구 떡 치구…”. “ 아예 데리고 살아라, 살아…”
‘떡?’ 금방 나간 사내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뜻은 알수가 없었다.
“뭐 해? 어여 패나 돌려!” 소
요가 잠잠해지고 다시 화투가 돌아갔다.
몇 판이 돌아가도록 쑥맥처럼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는 영호엄마가 재미있었는지 사내들이 농을 붙인다.
“아줌마 멍하니 앉았지만 말고 딴 사람한테 아양 좀 떨어! 고리도 좀 띠고…”
하며 천원 권 지폐 몇 장을 덥석 영호엄마의 손에 쥐어준다. 이후로 이사람 저 사람 판이 바뀔 때마다 천원짜리 한두 장이 영호엄마에게 건네졌다.
“쓰리 고!, 터졌다!”
옆자리 김 씨가 입이 함박만해지며 점수를 세고, 자리로 날아든 돈을 추스렸다.
“에이! 기분이다.” 하며 만원 권 한 장을 턱 하니 영호엄마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벌써 이만원이 넘게 모였다. 영호엄마는 기분이 좋았다.
꼬무락 꼬무락 - 김 씨의 손이었다. 만원짜리 한 장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이후 김 씨의 손이 이따금씩 패를 칠 때를 제외하고는 영호엄마의 허벅지 위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이젠 꼬무락거리다 슬슬 비비기도 하고, 주무르기까지 했다.
사람들 시선이 화투 패에 반, 영호엄마의 허벅지에 반씩 나눠졌다.
남자 손길이 얼마만인가! 겉 옷이라지만 얇은 홑 바지 위에 거친 사내의 손은 금새 영호엄마의 얼굴을 붉게 만들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내심 창규엄마가 오지않나 기다렸지만, 이미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있었다.
슬쩍 김 씨의 손이 영호엄마의 사타구니를 건드렸다.
찌르르 ? 하는 전율을 느끼며 화들짝 놀라 일어선 영호엄마, 뭐라 말 한마디 못한 체 자릴 빠져 나왔다. 뒤로 키득거리는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화를 내고 욕을 해 줄걸 그랬나…’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지만 그렇게 그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돈 때문일까? 아님 오랜만에 갖은 느낌…’
[email protected]
2부
“띠릴리리!”
전화벨소리가 들렸지만 움직이기도 싫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받어 ? 창규형 엄마래.”
“난데, 낼 아침 여섯시에 전철역으로 나와, 편한 옷 한 벌 싸가지구 그럼, 내일 보자~ 딸깍!”
아침 일찍 서둘러 전철역을 향했다. 저만치 손을 흔드는 창규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몇 번을 부탁해서 어렵게 난 자리야.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잘 나와야 돼! 일하다 힘들면 좀 쉬면서 요령껏 하고…”
친절히 당부의 말도 잊지않는 창규엄마가 고마웠다.
잠시 후 그녀들 앞으로 봉고차 한대가 도착했다.
“드르륵”, ”타세요!”
인사할 겨를도 없이 문이 열리며 창규엄마가 얼른 타라는 듯이 등을 떠밀었다.
차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타고 있었고, 아침인데도 땀냄새에 머리냄새 등이 범벅이 되어 코를 찔렀다. 좁게 껴 앉아 가는 차 안에서 운전석남자와 옆자리 남자가 힐끗힐끗 영호엄마를 곁눈질했다.
“영호엄마!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창규엄마가 말했다.
창규엄마를 따라가니 현장 한 구퉁이에 임시로 판자를 붙여 만든 간이 칸막이식 창고가 있었다. 컴컴한 창고 안 - 익숙하게 천정에 벽열등을 켜는 창규엄마, 문을 닫고는 빠르게 옷을 벗는다. 잠금 장치 하나 없는 칸막이 안에서 스스럼없이 덜렁 팬티, 브라쟈만 남은 창규엄마 앞에서 머뭇거리는 영호엄마
“뭐 해? 얼른 갈아입지 않고?”
이윽고, 엉거주춤 옷을 벗는 영호엄마였다. 영호엄마가 손을 뻗어 머리위로 티셔츠를 당기는 순간 “털렁!”하며 아이머리만 한 유방이 작은 가리개에 겨우 붙잡힌 체 출렁였다.
“와~아!” 그때였다. 분명 남자소리 였다.
누군가 문틈사이로 몰래 지켜보다 영호엄마의 큰 가슴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낸 것이다.
“너 새끼 저리못가!”
앙칼진 창규엄마의 고성이 이어졌고, “후다닥!” 달음질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놀랐지? 장 씨라고 그 사람 아들래민데 약간 모자라, 저렇게 가끔 엿본다니까…궁금한가 봐.”
“열 일곱이지 아마. 그 애가 저 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장 씨에게 말했더니, 아이를 반죽일 만큼 패더라. 그 뒤로는 더러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곤 했었는데 또 저러네…” 창규엄마가 농담 섞인 말로 애써 설명했다.
“자아~, 다들 인사하지. 이번에 김 아줌마 소개로 오신 성이…박! 박 아줌마라 하죠 뭐, 인사들 나누세요.”
소장이다. 이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십대에서 오십대까지 다양한 연령에 식구들은 모두 열 다섯이 전부였다. ‘저 앳된 소년이 아까 그…’ 키는 껑충하지만 얼굴은 앳된 소년과 날카로운 콧날의 장 씨가 나란히 서 있었다.
각기 일을 맡아 뿔뿔이 흩어지고, 영호엄마는 상호라는 총각과 한조가 되었다.
“아줌마! 드릴 좀 집어 줘요.” 상호 총각은 친절했다. 묵묵히 일도 열심히 하고, 이따금씩 공구 이름을 알려주며 편하게 대하려 애쓰는 게 착한 총각 같았다.
점심시간 ? 함바집으로 모여든 건장한 사내들이 산처럼 퍼 담은 밥을 떠넣고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 창규엄마를 다르니, 그 곳에는 이미 여럿이 모여 있었다. 널 부러져 잠자는 사람들 옆을 지나 화투 판 곁에 쓸쩍 자리를 잡았다.
“이제 와요?”
젊은 사내가 창규엄마를 아는 체 하자 모두 고개를 들어 창규엄마 일행을 쳐다보았다.
“잠깐 여기 앉아 구경 좀 해” 머뭇거리며 서 있는 모습에 창규엄마가 손을 당겼다.
이미 판이 무르익었는지 여기 저기 만원 권 지폐가 수북하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저리 많아?"하는 생각으로 휘둥그래 할 동안에도 제법 거세게 돈이 오갔다. 그 중에 창규엄마는 갖은 아양과 애교를 섞어가며 조금씩 고리를 뜯어냈다.
이십여분이 지났을까…모르긴 몰라도 창규엄마의 주머니로 이,삼만원은 족히 들어갔나 보다.
“나 물 좀 버리고 올께!”
아까 그 젊은 사내가 주섬주섬 돈을 챙기며 일어섰다.
“영호엄마! 이리 앉아, 내 대신 고리 좀 뗘… 괜찮아…”
잠시 후, 창규엄마가 일어서며 말했다. 싫은 표정의 영호엄마를 억지로 끼어 앉혀 놓고는 슬그머니 빠져 나갔다.
“저 자식! 또 떡 치러 가네, 돈 벌구 떡 치구…”. “ 아예 데리고 살아라, 살아…”
‘떡?’ 금방 나간 사내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뜻은 알수가 없었다.
“뭐 해? 어여 패나 돌려!” 소
요가 잠잠해지고 다시 화투가 돌아갔다.
몇 판이 돌아가도록 쑥맥처럼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는 영호엄마가 재미있었는지 사내들이 농을 붙인다.
“아줌마 멍하니 앉았지만 말고 딴 사람한테 아양 좀 떨어! 고리도 좀 띠고…”
하며 천원 권 지폐 몇 장을 덥석 영호엄마의 손에 쥐어준다. 이후로 이사람 저 사람 판이 바뀔 때마다 천원짜리 한두 장이 영호엄마에게 건네졌다.
“쓰리 고!, 터졌다!”
옆자리 김 씨가 입이 함박만해지며 점수를 세고, 자리로 날아든 돈을 추스렸다.
“에이! 기분이다.” 하며 만원 권 한 장을 턱 하니 영호엄마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벌써 이만원이 넘게 모였다. 영호엄마는 기분이 좋았다.
꼬무락 꼬무락 - 김 씨의 손이었다. 만원짜리 한 장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이후 김 씨의 손이 이따금씩 패를 칠 때를 제외하고는 영호엄마의 허벅지 위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이젠 꼬무락거리다 슬슬 비비기도 하고, 주무르기까지 했다.
사람들 시선이 화투 패에 반, 영호엄마의 허벅지에 반씩 나눠졌다.
남자 손길이 얼마만인가! 겉 옷이라지만 얇은 홑 바지 위에 거친 사내의 손은 금새 영호엄마의 얼굴을 붉게 만들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내심 창규엄마가 오지않나 기다렸지만, 이미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있었다.
슬쩍 김 씨의 손이 영호엄마의 사타구니를 건드렸다.
찌르르 ? 하는 전율을 느끼며 화들짝 놀라 일어선 영호엄마, 뭐라 말 한마디 못한 체 자릴 빠져 나왔다. 뒤로 키득거리는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화를 내고 욕을 해 줄걸 그랬나…’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지만 그렇게 그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돈 때문일까? 아님 오랜만에 갖은 느낌…’
[email protected]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9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9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