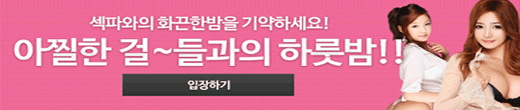12부
어떻게 오후 일을 마쳤는지 모르겠다.
팬티 밑으로 두툼하게 휴지를 말아댄채 거북한 걸음으로 창고로 향하는 영호엄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썰렁한 창고 안에서 작업복을 벗어 한쪽에 접어 둔 채 옷가지를 꺼내려고 짐 꾸러미에 손을 넣었다.
“이게 뭐야?”
물컹하며 축축한 물기가 손에 닿았다.
꺼내보니 스타킹에 누런 액체가 흥건히 고여 스며져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혹시…’
짐작이 가는 듯 불쾌한 표정을 짓는 영호엄마
“덜컹”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빠르게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았다.
장씨 아들이었다.
“어 맛! 누구야?”
황급히 돌아앉은 영호엄마가 놀라 소리쳤다.
“너 빨리 안 나갈래? 소리지른다!”
팔짱을 끼어 가슴을 가린 채 욱박지르는 영호엄마를 빤히 내려다보는 장씨아들
“나…나 두 돈 있어요…”
장씨아들이 더듬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과연 손 안에 꼬깃꼬깃한 만원짜리가 들려 있었다.
벌써 소문이 났는지 아님 영호엄마를 미행하다 몰래 엿봤는지 장씨아들은 그렇게 돈을 들고 영호엄마를 찾아왔다.
“까불지 말고 빨리 나가, 아빠한테 이르기 전에”
억지로 차분한 어투로 영호엄마가 말했다.
“드르르륵”
뒤로 숨겨져 있던 손에서 공구용 카터칼이 들려 있었다.
장씨아들이 길게 날을 뽑은 뒤 영호엄마의 눈 앞에 칼을 들어 보였다.
“나 두… 하…하고 싶어요, 보…보지도 보고싶고…”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는 장씨아들의 기세에 눌린 영호엄마의 가슴이 두근 두근 했다.
‘이를 어째? 설마 나를…”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날지 몰랐다.
백열등에 비친 칼날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래, 알았어. 그거 치워, 해 줄께…”
금방 장씨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칼을 쥔 손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바지를 벗어야지…”
장씨아들이 서둘러 바지를 벗었다.
서서히 다가앉는 영호엄마 ? 장씨아들의 팬티를 내리자 길쭉한 자지가 우뚝 서서 기다렸다.
순간 비릿한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긴 자지 끝에서 포경도 안 했는지 거뭍한 거죽에 덮여 뻘건 귀두가 살짝 드러났다.
비위가 틀리고 금방이라도 구역질이 날것 같았지만 장씨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꾹 눌러 참는다.
한 손으로 늘어진 불알을 어루만지며 한 손으로는 머리부터 감싸 쥐고 자지를 까내려가자 눈물 흘리는 좃대가리가 드러났다.
역겨운 냄새가 가실 때까지 귀두에서 밑둥까지 위 아래로 연신 흔들어대자 자지가 꿈틀대며 힘줄이 솟았다.
“으-윽! 아…”
난생처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 그것도 매일 상상 속에서 따먹던 박 아줌마가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의 자지를 만지며 흔들어대자, 장씨아들은 꿀 맛 같은 황홀 감에 빠져든다.
영호엄마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짜릿한 전율이 전해왔다.
금방이라도 쌀 것처럼 힘줄이 툭툭 불거진 자지가 달아올랐다.
“아…아줌마 너무 좋아… 이…이제 아줌마 보지에 하고 싶어요…”
“미안해, 오늘은 보지가 너무 아퍼. 그냥 손으로 해 줄께…”
영호엄마가 두 손으로 자지를 꽉 쥐고는 더욱 세차게 흔들었다.
장씨아들이 정말 내려다보니 쪼그려 앉은 영호엄마의 사타구니 사이로 팬티 옆으로 살짝 삐져나온 휴지가 엿보인다.
실망한 듯 낙심한 표정으로 이번엔 슬그머니 브라자위에 손을 얹고 유방을 비벼댔다.
‘뭉클’ 얼마나 만져보고 싶던 유방인가 ? 아침에도 아줌마의 유방을 생각하며 한웅큼 좃물을 쏟아낸 장씨아들이었다.
‘이 부드러운 감촉…세상에 이보다 더 부드럽고 말랑한 게 있을까…’
참지 못한 손이 가리개 속으로 파고들자 자연 가리개는 밑으로 쏠려 덩그러니 나온 유방을 받쳐 올린다.
검 붉은 영호엄마의 젖꼭지가 장씨아들을 향한 채 나란히 서 있었다.
장씨아들이 영호엄마의 젖꼭지가 신기한 듯 비틀어보고 또 꼬집기도 해본다.
“아 - 아아!”
영호엄마가 야릇한 소리를 내자 신이 나서 연신 유두를 괴롭히는 장씨아들
“아! 아퍼, 그렇게 하면…”
“아 미안해요…”
장씨아들이 미안했던지 살살 꼭지를 달래듯 만져주며 제법 부드럽게 유방을 어루만졌다.
영호엄마는 서서히 가슴에서 야릇한 느낌이 전해오자 슬슬 몸이 달아오른다.
어느덧 비릿한 자지냄새에 익숙해지며 눈앞에 불쑥 불쑥 다가오는 장씨아들의 길다란 자지를 빨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동정 ? 비록 모지리 앳된 어린애지만 늘 나를 생각하며 꿈 꿔왔겠지…’
지금껏 학대와 모멸 속에서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탓일까? 비록 칼을 들고 나타났지만 그런 의도도 용기도 없어보이는 오로지 영호엄마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돌출된 행동이리라 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첫 여자로서의 기분 좋은 감정을 세 겨 주고 싶었다.
영호엄마가 고개를 들어 장씨아들의 자지를 입으로 가져갔다.
“아-아… 너무 좋아요…”
이런 기분이었을까! 뭉클하고 따듯한 느낌이 자지 전체를 감싸오자 몸 안에 모든 신경이 그 끝에 모아지며 절로 탄성이 나왔다.
“쭈욱…쭙..쭙..4 059;”
부드럽게 자지를 쓸던 입술이 차츰 힘주어 물어가며 점차 뿌리 채 삼켜갔다.
“아아-아! 아줌마 …어떻해…쌀 것 같에요.”
견디기 힘들었을까 - 장씨아들이 들고 있던 카터칼을 툭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대로 굳어진 채 모든 것을 영호엄마에게 맡긴다.
“싸도 돼, 괜찮아.”
자지에서 입을 뺀 영호엄마가 대답하며 두어 번 흔들었을까
“파 바 밧”
장씨아들의 자지 끝에서 분수처럼 좃물이 튀어올랐다.
“탁 탁 탁 질컥 질컥.”
영호엄마가 장씨아들의 자지를 계속 흔들어대자 연이어 좃물이 쏟아져 나왔다.
“투두 툭!”
바닥에 흩어지는 누런 좃물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꿈틀대는 아들의 자지를 입으로 가져갔다.
끄덕이며 몇 방울의 좃물들이 마져 토해내는 자지를 모두 빨아가며 깨끗하게 혀로 핥아준다.
“고…고마워요, 아줌마”
사정이 끝나자 이성이 돌아오는지 미안한 표정으로 장씨아들이 말했다.
“한번만 이야, 다시 그럼 안돼! 또 그러면 장씨에게 이를거야.”
“네…”
어떻게 오후 일을 마쳤는지 모르겠다.
팬티 밑으로 두툼하게 휴지를 말아댄채 거북한 걸음으로 창고로 향하는 영호엄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썰렁한 창고 안에서 작업복을 벗어 한쪽에 접어 둔 채 옷가지를 꺼내려고 짐 꾸러미에 손을 넣었다.
“이게 뭐야?”
물컹하며 축축한 물기가 손에 닿았다.
꺼내보니 스타킹에 누런 액체가 흥건히 고여 스며져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혹시…’
짐작이 가는 듯 불쾌한 표정을 짓는 영호엄마
“덜컹”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빠르게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았다.
장씨 아들이었다.
“어 맛! 누구야?”
황급히 돌아앉은 영호엄마가 놀라 소리쳤다.
“너 빨리 안 나갈래? 소리지른다!”
팔짱을 끼어 가슴을 가린 채 욱박지르는 영호엄마를 빤히 내려다보는 장씨아들
“나…나 두 돈 있어요…”
장씨아들이 더듬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과연 손 안에 꼬깃꼬깃한 만원짜리가 들려 있었다.
벌써 소문이 났는지 아님 영호엄마를 미행하다 몰래 엿봤는지 장씨아들은 그렇게 돈을 들고 영호엄마를 찾아왔다.
“까불지 말고 빨리 나가, 아빠한테 이르기 전에”
억지로 차분한 어투로 영호엄마가 말했다.
“드르르륵”
뒤로 숨겨져 있던 손에서 공구용 카터칼이 들려 있었다.
장씨아들이 길게 날을 뽑은 뒤 영호엄마의 눈 앞에 칼을 들어 보였다.
“나 두… 하…하고 싶어요, 보…보지도 보고싶고…”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는 장씨아들의 기세에 눌린 영호엄마의 가슴이 두근 두근 했다.
‘이를 어째? 설마 나를…”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날지 몰랐다.
백열등에 비친 칼날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래, 알았어. 그거 치워, 해 줄께…”
금방 장씨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칼을 쥔 손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바지를 벗어야지…”
장씨아들이 서둘러 바지를 벗었다.
서서히 다가앉는 영호엄마 ? 장씨아들의 팬티를 내리자 길쭉한 자지가 우뚝 서서 기다렸다.
순간 비릿한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긴 자지 끝에서 포경도 안 했는지 거뭍한 거죽에 덮여 뻘건 귀두가 살짝 드러났다.
비위가 틀리고 금방이라도 구역질이 날것 같았지만 장씨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꾹 눌러 참는다.
한 손으로 늘어진 불알을 어루만지며 한 손으로는 머리부터 감싸 쥐고 자지를 까내려가자 눈물 흘리는 좃대가리가 드러났다.
역겨운 냄새가 가실 때까지 귀두에서 밑둥까지 위 아래로 연신 흔들어대자 자지가 꿈틀대며 힘줄이 솟았다.
“으-윽! 아…”
난생처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 그것도 매일 상상 속에서 따먹던 박 아줌마가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의 자지를 만지며 흔들어대자, 장씨아들은 꿀 맛 같은 황홀 감에 빠져든다.
영호엄마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짜릿한 전율이 전해왔다.
금방이라도 쌀 것처럼 힘줄이 툭툭 불거진 자지가 달아올랐다.
“아…아줌마 너무 좋아… 이…이제 아줌마 보지에 하고 싶어요…”
“미안해, 오늘은 보지가 너무 아퍼. 그냥 손으로 해 줄께…”
영호엄마가 두 손으로 자지를 꽉 쥐고는 더욱 세차게 흔들었다.
장씨아들이 정말 내려다보니 쪼그려 앉은 영호엄마의 사타구니 사이로 팬티 옆으로 살짝 삐져나온 휴지가 엿보인다.
실망한 듯 낙심한 표정으로 이번엔 슬그머니 브라자위에 손을 얹고 유방을 비벼댔다.
‘뭉클’ 얼마나 만져보고 싶던 유방인가 ? 아침에도 아줌마의 유방을 생각하며 한웅큼 좃물을 쏟아낸 장씨아들이었다.
‘이 부드러운 감촉…세상에 이보다 더 부드럽고 말랑한 게 있을까…’
참지 못한 손이 가리개 속으로 파고들자 자연 가리개는 밑으로 쏠려 덩그러니 나온 유방을 받쳐 올린다.
검 붉은 영호엄마의 젖꼭지가 장씨아들을 향한 채 나란히 서 있었다.
장씨아들이 영호엄마의 젖꼭지가 신기한 듯 비틀어보고 또 꼬집기도 해본다.
“아 - 아아!”
영호엄마가 야릇한 소리를 내자 신이 나서 연신 유두를 괴롭히는 장씨아들
“아! 아퍼, 그렇게 하면…”
“아 미안해요…”
장씨아들이 미안했던지 살살 꼭지를 달래듯 만져주며 제법 부드럽게 유방을 어루만졌다.
영호엄마는 서서히 가슴에서 야릇한 느낌이 전해오자 슬슬 몸이 달아오른다.
어느덧 비릿한 자지냄새에 익숙해지며 눈앞에 불쑥 불쑥 다가오는 장씨아들의 길다란 자지를 빨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동정 ? 비록 모지리 앳된 어린애지만 늘 나를 생각하며 꿈 꿔왔겠지…’
지금껏 학대와 모멸 속에서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탓일까? 비록 칼을 들고 나타났지만 그런 의도도 용기도 없어보이는 오로지 영호엄마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돌출된 행동이리라 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첫 여자로서의 기분 좋은 감정을 세 겨 주고 싶었다.
영호엄마가 고개를 들어 장씨아들의 자지를 입으로 가져갔다.
“아-아… 너무 좋아요…”
이런 기분이었을까! 뭉클하고 따듯한 느낌이 자지 전체를 감싸오자 몸 안에 모든 신경이 그 끝에 모아지며 절로 탄성이 나왔다.
“쭈욱…쭙..쭙..4 059;”
부드럽게 자지를 쓸던 입술이 차츰 힘주어 물어가며 점차 뿌리 채 삼켜갔다.
“아아-아! 아줌마 …어떻해…쌀 것 같에요.”
견디기 힘들었을까 - 장씨아들이 들고 있던 카터칼을 툭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대로 굳어진 채 모든 것을 영호엄마에게 맡긴다.
“싸도 돼, 괜찮아.”
자지에서 입을 뺀 영호엄마가 대답하며 두어 번 흔들었을까
“파 바 밧”
장씨아들의 자지 끝에서 분수처럼 좃물이 튀어올랐다.
“탁 탁 탁 질컥 질컥.”
영호엄마가 장씨아들의 자지를 계속 흔들어대자 연이어 좃물이 쏟아져 나왔다.
“투두 툭!”
바닥에 흩어지는 누런 좃물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꿈틀대는 아들의 자지를 입으로 가져갔다.
끄덕이며 몇 방울의 좃물들이 마져 토해내는 자지를 모두 빨아가며 깨끗하게 혀로 핥아준다.
“고…고마워요, 아줌마”
사정이 끝나자 이성이 돌아오는지 미안한 표정으로 장씨아들이 말했다.
“한번만 이야, 다시 그럼 안돼! 또 그러면 장씨에게 이를거야.”
“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9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9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