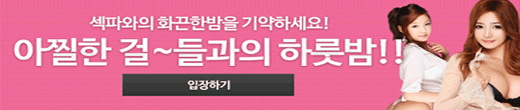엣, 첫 작품입니다. 처녀작이라 모자라는 점이 있어도 봐 주세요 ^^;;
==============================
계약 -
계약을 맺어라 -
인정하기 싫어도 너는 주인 -
더 많은 -
노예를 -
“아...거참 시끄럽네...그까짓 노예들 다스릴 맛 뭐가 있다고...”
음력 1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밤. 그 날의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고, 유난히 컸다. 그 이유를 알 길 없으나,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짜증나는 일이 되었던 것 같다, 보름달을 바라보며 불평과 저주를 퍼붓는 걸 보면.
“젠장, 네 놈이 가까이 오는 바람에 저 쪽 놈들이 나한테 귓말을 뿌려대잖아. 노예를 만들라고, 계약을 하라고 말이다.”
아직은 쌀쌀한 겨울 끝자락의 날씨, 그 강변 둑을 어떤 남자가 걷고 있었다. 이상스럽게도 얇은 와이셔츠 한 장에 검은 바지 하나만 입고 이 날씨를 버티는 그의 체력도 괴이해 보였지만, 무엇보다 괴이한 것은, 푸르디 푸른 -
너무나 푸른 머리카락 -
게다가 푸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1미터는 족히 될 듯 기른 그의 머리카락이었지만, 그것은 절대로 난잡하다거나, 복잡한 느낌을 주지 않고 마치 유려한 붓처럼 움직이면서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고 있었다.
“...귓말만 뿌려대면 좋으련만, 그것도 모자라 채팅창을 연 분도 계시구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주변으로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며 그에게 낙엽이 휘날렸다.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그런 강풍이, 말도 안 ?정도의 강풍이 불어 닥치다니.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아무도 그 남자나 바람을 주목하지 않았다.
“오래간만입니다, 미라슈 -”
“아, 나도 오래간만이야.”
남자의 앞에 나타난 것은 어떤 여인이었다. 마치 중동의 여인을 연상시키는 로브를 뒤집어 쓴 여인. 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고, 중동의 로브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더 많이 껴 입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미라슈라고 불린 여인은 남자를 향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소년을 향해 말을 이어나갔다.
“그나저나, 계속 이렇게 유랑하고 다닐건가?”
소년은 그 질문에 재미있다는 듯이 입술 한 쪽 끝을 삐죽이 올리며 어딘가 찢어진 듯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저의 아버지...아, 지금 여기서 이름을 부르긴 뭐 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유랑시절 쓰시던 이름인 에루틴지스로 하죠. 저의 아버지 에루틴지스 각하께서는 무려 1천년 가까이 시그를 떠돌던 것으로 아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 그랬지. 정확히 1075년간이야. 내가 목궁의 1층 관리총장을 맡아서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고작 1년 간 여기서 머무는 건 다들 무어라 하는 군요.”
“난 무어라 한 적 없다. 그냥 계속 유랑할 거냐고 물어봤을 뿐이야.”
그녀의 역습에 소년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있다가, 한 방 먹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이 큭큭큭 거리며 웃어 제쳤다.
“쳇, 역시 17년 산 풋내기는 이 천살이 넘으신 어른께는 당할 수가 없군요.”
“글쎄다. 에루틴지스의 피를 이어받은 너인 이상 20살이 되면 나이만 많다 뿐인 평범한 몽환인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나 같은. 하지만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야. 너, 웬만하면 이제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싫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미라슈, 거기에 즉각적으로 확답을 내놓는 소년. 둘 사이에는 잠시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며 침묵도 같이 흘렀다.
“...시그와 이곳은 틀려, 이곳은 시그라고는 하지만 정화된 공간...여기에 타성의 의지가 끼어들면 귀찮은 일만 벌어질 뿐이다. 노예를 데리고 오라는 재촉도 강해질 거야. 노예를 원하는 건 아니잖나, 규.”
규는 눈살을 찌푸리며 미라슈를 바라보았지만, 미라슈 역시 지지 않고 규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규의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오갔다. 다른 허접스러운 놈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미라슈, 아버지의 천년이 넘는 몽환인 친구. 몽환인이든, 홍접인이든 이 천살이 넘어가는 존재는 이미 타고난 재능을 넘어선 경험치가 쌓여있다. 게다가 미라슈는 마치 자신이 재능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양 말했지만, 아버지 에루틴지스의 말은 달랐다. 지금 싸운다면 아무리 자신이 에루틴지스의 아들이라 한들 이기기 힘들 뿐 더러, 자신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르기 힘들어 진다.
“...강요하지는 않겠다, 규. 네가 정 이 세상에 머문다면 이유가 있는 거겠지. 혹여나 그냥 놀고 싶은 것 뿐이라도, 뭐 젊은 때는 그게 좋을 지도.”
규는 팔에 긴장을 풀고 가라앉은 눈빛으로 미라슈를 바라보았다. 어이없었다, 조금은. 잔뜩 폼을 잡으며 나올 때는 언제다가...하지만 이래서 미라슈가 좋았다. 미라슈에게 말할 때 만큼은, 규도 어머니가 생긴 듯 했다. 떼를 쓰면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자신이 투정부리는 아이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규는 즐기고 있었다. 에루틴지스에게 투정부리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무책임 하시네요.”
“아, 에루틴지스, 그 녀석도 내가 더 이상 1층장 안한다고 할 때 그 말을 하더군.”
규는 또 다시 킥킥거리면서 웃어대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다시 미라슈를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미라슈는 사라져 있었다.
- 그래,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아아, 귓말은 정말 딱 질색인데...저는 채팅창이 차라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할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규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띄며 말하였다.
“애완동물이나 몇 마리 길러볼 생각입니다, 아주 예쁜 것들로.”
==============================
계약 -
계약을 맺어라 -
인정하기 싫어도 너는 주인 -
더 많은 -
노예를 -
“아...거참 시끄럽네...그까짓 노예들 다스릴 맛 뭐가 있다고...”
음력 1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밤. 그 날의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고, 유난히 컸다. 그 이유를 알 길 없으나,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매우 짜증나는 일이 되었던 것 같다, 보름달을 바라보며 불평과 저주를 퍼붓는 걸 보면.
“젠장, 네 놈이 가까이 오는 바람에 저 쪽 놈들이 나한테 귓말을 뿌려대잖아. 노예를 만들라고, 계약을 하라고 말이다.”
아직은 쌀쌀한 겨울 끝자락의 날씨, 그 강변 둑을 어떤 남자가 걷고 있었다. 이상스럽게도 얇은 와이셔츠 한 장에 검은 바지 하나만 입고 이 날씨를 버티는 그의 체력도 괴이해 보였지만, 무엇보다 괴이한 것은, 푸르디 푸른 -
너무나 푸른 머리카락 -
게다가 푸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1미터는 족히 될 듯 기른 그의 머리카락이었지만, 그것은 절대로 난잡하다거나, 복잡한 느낌을 주지 않고 마치 유려한 붓처럼 움직이면서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고 있었다.
“...귓말만 뿌려대면 좋으련만, 그것도 모자라 채팅창을 연 분도 계시구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주변으로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며 그에게 낙엽이 휘날렸다.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그런 강풍이, 말도 안 ?정도의 강풍이 불어 닥치다니.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아무도 그 남자나 바람을 주목하지 않았다.
“오래간만입니다, 미라슈 -”
“아, 나도 오래간만이야.”
남자의 앞에 나타난 것은 어떤 여인이었다. 마치 중동의 여인을 연상시키는 로브를 뒤집어 쓴 여인. 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고, 중동의 로브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더 많이 껴 입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미라슈라고 불린 여인은 남자를 향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소년을 향해 말을 이어나갔다.
“그나저나, 계속 이렇게 유랑하고 다닐건가?”
소년은 그 질문에 재미있다는 듯이 입술 한 쪽 끝을 삐죽이 올리며 어딘가 찢어진 듯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저의 아버지...아, 지금 여기서 이름을 부르긴 뭐 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유랑시절 쓰시던 이름인 에루틴지스로 하죠. 저의 아버지 에루틴지스 각하께서는 무려 1천년 가까이 시그를 떠돌던 것으로 아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 그랬지. 정확히 1075년간이야. 내가 목궁의 1층 관리총장을 맡아서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고작 1년 간 여기서 머무는 건 다들 무어라 하는 군요.”
“난 무어라 한 적 없다. 그냥 계속 유랑할 거냐고 물어봤을 뿐이야.”
그녀의 역습에 소년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있다가, 한 방 먹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이 큭큭큭 거리며 웃어 제쳤다.
“쳇, 역시 17년 산 풋내기는 이 천살이 넘으신 어른께는 당할 수가 없군요.”
“글쎄다. 에루틴지스의 피를 이어받은 너인 이상 20살이 되면 나이만 많다 뿐인 평범한 몽환인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나 같은. 하지만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야. 너, 웬만하면 이제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싫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미라슈, 거기에 즉각적으로 확답을 내놓는 소년. 둘 사이에는 잠시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며 침묵도 같이 흘렀다.
“...시그와 이곳은 틀려, 이곳은 시그라고는 하지만 정화된 공간...여기에 타성의 의지가 끼어들면 귀찮은 일만 벌어질 뿐이다. 노예를 데리고 오라는 재촉도 강해질 거야. 노예를 원하는 건 아니잖나, 규.”
규는 눈살을 찌푸리며 미라슈를 바라보았지만, 미라슈 역시 지지 않고 규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규의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오갔다. 다른 허접스러운 놈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미라슈, 아버지의 천년이 넘는 몽환인 친구. 몽환인이든, 홍접인이든 이 천살이 넘어가는 존재는 이미 타고난 재능을 넘어선 경험치가 쌓여있다. 게다가 미라슈는 마치 자신이 재능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양 말했지만, 아버지 에루틴지스의 말은 달랐다. 지금 싸운다면 아무리 자신이 에루틴지스의 아들이라 한들 이기기 힘들 뿐 더러, 자신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르기 힘들어 진다.
“...강요하지는 않겠다, 규. 네가 정 이 세상에 머문다면 이유가 있는 거겠지. 혹여나 그냥 놀고 싶은 것 뿐이라도, 뭐 젊은 때는 그게 좋을 지도.”
규는 팔에 긴장을 풀고 가라앉은 눈빛으로 미라슈를 바라보았다. 어이없었다, 조금은. 잔뜩 폼을 잡으며 나올 때는 언제다가...하지만 이래서 미라슈가 좋았다. 미라슈에게 말할 때 만큼은, 규도 어머니가 생긴 듯 했다. 떼를 쓰면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자신이 투정부리는 아이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규는 즐기고 있었다. 에루틴지스에게 투정부리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무책임 하시네요.”
“아, 에루틴지스, 그 녀석도 내가 더 이상 1층장 안한다고 할 때 그 말을 하더군.”
규는 또 다시 킥킥거리면서 웃어대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다시 미라슈를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미라슈는 사라져 있었다.
- 그래,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아아, 귓말은 정말 딱 질색인데...저는 채팅창이 차라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할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규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띄며 말하였다.
“애완동물이나 몇 마리 길러볼 생각입니다, 아주 예쁜 것들로.”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1-26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1-26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